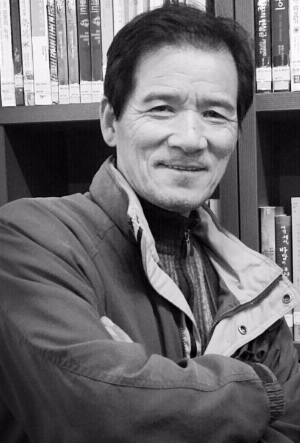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한계령에서 시작해 대청봉까지 올랐다가 중청, 소청을 거쳐 희운각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공룡능선을 타고 마등령을 지나 비선대 설악동으로 나오는 난도 최상의 등산 코스다.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해야지, 다리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해도 아직 산을 탈 힘이 남아있을 때 다녀와야겠다는 생각도 나를 설악행을 부추겼을 게 틀림없다. 산행 중에 솜다리 꽃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없진 않았지만 꼭 보고 오겠다는 다짐은 하지 않았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바란다고 다 이뤄지지 않고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시절 인연이란 게 있어서 볼 때가 되면 일부러 찾지 않아도 보게 될 것이다.
여행사를 통해 떠나는 여행이라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진 않을까 약간 걱정을 했으나 좋은 인연을 만나 즐거운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었다. 좌석 배정을 받은 대로 앉았는데 내 옆자리에 앉은 분이 나처럼 홀로 여행 온데다 나이도 동갑이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힘든 산행길에 마음이 통하는 동행이 있다는 건 실로 큰 행운이다. 서로를 배려하며 휴식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으며 대청봉까지 올랐다. 숙소가 달라 소청삼거리에서 동행과 헤어져 희운각 대피소에서 고단한 몸을 쉬었다. 꽃보다 단풍이 더 고운 계절이라 많은 꽃을 볼 수는 없었다. 산을 오르는 동안 금강초롱꽃과 투구꽃 그리고 철부지 털진달래꽃을 본 것은 큰 수확이었다.
숙소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밤 11시. 고단한 산행 끝에 잠이 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에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뒤척이다 궁리 끝에 조용히 짐을 꾸려 홀로 밤길을 나섰다. 위험한 야간산행을 하려는 생각보다는 얼마만큼 가다가 조용한 곳에서 밤하늘의 별이나 실컷 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 헤드랜턴을 켰으나 사방이 캄캄한 어둠에 싸여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하나 넘었을까. 하늘이 잘 보이는 편평한 곳에 자리 잡고 배낭을 베고 누웠다. 하늘 가득 보석이 반짝이듯 별이 빛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수많은 별이 가까이에 떠 있었다. 오리온자리,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카시오페아자리… 아는 별자리를 찾아보며 그동안 별을 잊고 살았구나 싶어 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여명이 터오고 모든 사물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새벽에 설악의 중심, 공룡능선에 홀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공룡의 등처럼 삐죽삐죽 솟은 암봉들이 저마다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는 비경(祕境)을 홀로 즐긴다는 쾌감보다는 이토록 멋진 풍경 속에 나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이 행운에 감사했다. 그리고 나한봉을 지나 내려오는 길에 기적처럼 어제의 동행을 다시 만났다. 어제 헤어질 때 아침에 대청봉 일출을 보고 출발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산행 중에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전화번호도 묻지 않았었는데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덕분에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불타는 설악의 단풍을 즐기느라 고단한 하산길이 한결 편안해졌다. 비록 설악의 솜다리 꽃은 만나지 못했어도 이처럼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설악에 가고 싶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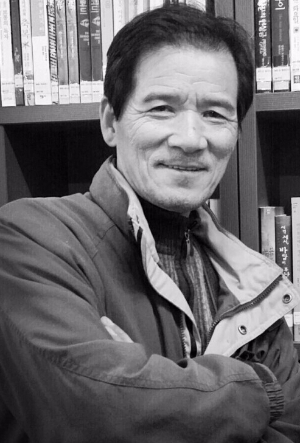



















![[초점] 머스크의 '황금 손길'…트럼프 재선 후 머스크 관련 자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22400234103649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