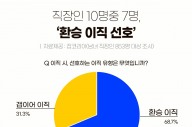과징금 액수만 놓고봐도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사상 최대인 데다 1곳만 나홀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 제재는 이통 3사가 같은 혐의로 연초 순차적 영업정지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4개월 만이며, 방통위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징계를 내린 셈이다.
보조금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판매점과 대리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원하는 마케팅 비용 ▲대리점과 판매점이 마진을 줄이면서 들이는 마케팅 비용 등을 합한 개념이다.
보조금에 대한 이통 3사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SKT는 보조금 시장을 얼려 가입자를 유지하려고 한다. KT는 LTE 열세로 뺐긴 가입자를 되찾는 게 급하다. LTE로 재미를 본 LGU+는 계속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그럼에도 보조금 경쟁은 이통사의 수익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이통사들은 방통위가 나서 보조금 시장을 잡아주길 바라는데 그 속내는 결국 이익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21조 원 이상을 마케팅에 썼다. 이후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이통사들은 80~90만 원대 스마트폰을 1000원짜리 버스폰으로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1분기에만 이통사들이 3조 원 이상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업체와 지역, 유통채널별로 다른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프라인처럼 온라인도 판매점들을 정부가 직접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행위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최신 휴대전화도 제 값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며, 문제는 보조금 자체가 영업비용이고 이 비용은 소비자들이 낸 통신비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과다한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는 한 통신비 인하는 어려워지고 통신비는 동일하게 사용량에 따라 내지만 특정 가입자만 과다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돈을 낸 사람과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으로 휴대전화 자체의 출고가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으며 이는 판매 시에 보조금으로 할인 효과를 받을 것까지 미리 계산해 공장에서 출고가를 매기면서 같은 휴대전화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즉각 대응하는 상시 조사 및 제재 체제를 도입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최소화하가로 했다.

















![[초점] 인구 노령화 여파, 이젠 ‘75세’부터가 노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0425095633009479a1f30943111092151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