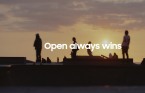최서영이 깜짝 놀랐다.
“오빠 말씀이 맞아요. 아가씨! 나도 최첨단 운운하는 거 별로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하긴 나도 그렇기는 해요”
한선희는 그제야 납득이 가는지 슬그머니 제 주장을 거두어들였다.
“아무튼 우리는 농사일이나 열심히 하자. 지금껏 최첨단의 것이 없어도 불편 없이 만족하게 살고 있으니 여기서 무엇을 더 바랄까?”
“그래요! 이만하면 만족하고도 넘쳐요! 아가씨 안 그래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한 것은 속내를 숨기고 마지못해 대답한 것은 아니었다. 소설을 쓸 때도 컴퓨터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껏 육필을 고집해온 것도 사실 기계와는 그리 정이 들지 않아서였다. 그리 생각해보면 어느새 자신도 오빠의 의식구조와 닮아져 가는 것 같아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
“언니,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나도 오빠를 닮아가거든요. 좀 고리타분하게........!”
선희가 말하고 깔깔 웃었다.
그러고 밤도 늦었고 밤바람이 차다며 그만 가서 자야지 하고는 제 방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그녀는 선희가 자리를 뜨자 마당에 오래 선 채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적지 않아서 다리도 아팠다. 앞산을 보니 나뭇가지에 내려앉았던 별들도 자리를 옮겨 저만큼 멀어져 있어서 밤도 제법 이슥한 것 같았다. 그래 그들 부부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란히 방으로 향했다.
장마철이기는 하지만 비는 그리 많이 내리지 않았다.
하늘이 요실금에라도 걸렸는지 잔뜩 흐려서 비가 흠뻑 쏟아질 것이라 기대한 날도 정원에 물 뿌리 듯 찔끔찔끔 뿌리다가 말았다.
그러니 밭농사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다. 푹푹 찌는 날씨에 콩이며 고구마 깻잎이 맥없이 시들시들 생기를 잃어가고 땅은 푸석푸석하고 쩍쩍 갈라졌다.
제 세상 만난 것은 개구리 매미 따위들이었다. 노래인지 울음인지 개구리가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밤잠 자기에 짜증스럽고, 낮이면 낮대로 숨이 깔딱 넘어갈 듯 악을 쓰고 외쳐 대는 매미소리가 성가셨다.
그러다가 8월이었다.
한여름에 땅을 뜨겁게 달군 열기가 사람을 푹푹 쪄서 밤낮없이 괴롭힐 즈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후득후득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흙냄새를 물씬 풍겼다. 워낙 심했던 가뭄이라 지나가는 소나기 이겠거니 하고 그나마 해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멀리서 가끔 들리던 천둥소리가 좀 지나자 바로 머리 위에서 번개가 하늘을 찢어놓고 뇌성이 지축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현장] AI컴퓨팅 전력소비 줄이기에 '사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041917582903842edf69f862c1182354136.jpg)














![[유럽 증시] 이스라엘 이란 타격에 유럽 3개국 지수 '동반 하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1720184501291a6e8311f642181479016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