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상의 한반도 삼한시대를 가다(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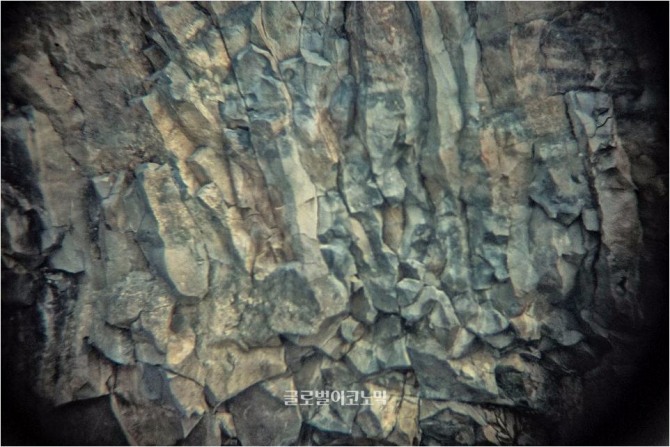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베개용암은 흐르는 용암의 가장 앞부분이 물과 접촉하며 표면이 갑작스럽게 냉각되면서 용암의 흐르는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베개용암의 표면은 빠른 냉각으로 인하여 치밀한 검은색의 유리질로 구성되었고 공기와 접촉하여 풍화가 많이 진행된다. 이러한 베개용암은 내륙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질유산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현무암질 응회암 내의 암편은 주로 현무암 역이 많으나, 일부 선캄브리아기의 편암, 각섬암 등 암편도 함유된다. 크래스트(clast)의 크기는 수㎜부터 수m인 경우도 있고, 모양은 각형-아각형-원형 등으로 다양하다. 기질의 구성광물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암회색, 암적색을 띠고 분출시에 휘발성 성분이 빠져나간 분기공(憤氣孔, amygdule)에는 풍화작용으로 이 암석에서 용식되어 빠져나온 칼슘분이 이차적으로 침전된 방해석(方解石, calcite) 결정들로 채워져 있다.
이 지역의 지사를 살펴보면, 한탄강과 만나는 동남쪽 자살바위의 아래에는 선캄브리아기의 퇴적암 기원인 각섬암 또는 호상편마암 등이 기반암을 구성하며, 그 상부를 중생대백악기의 현무암질 응회암이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김경상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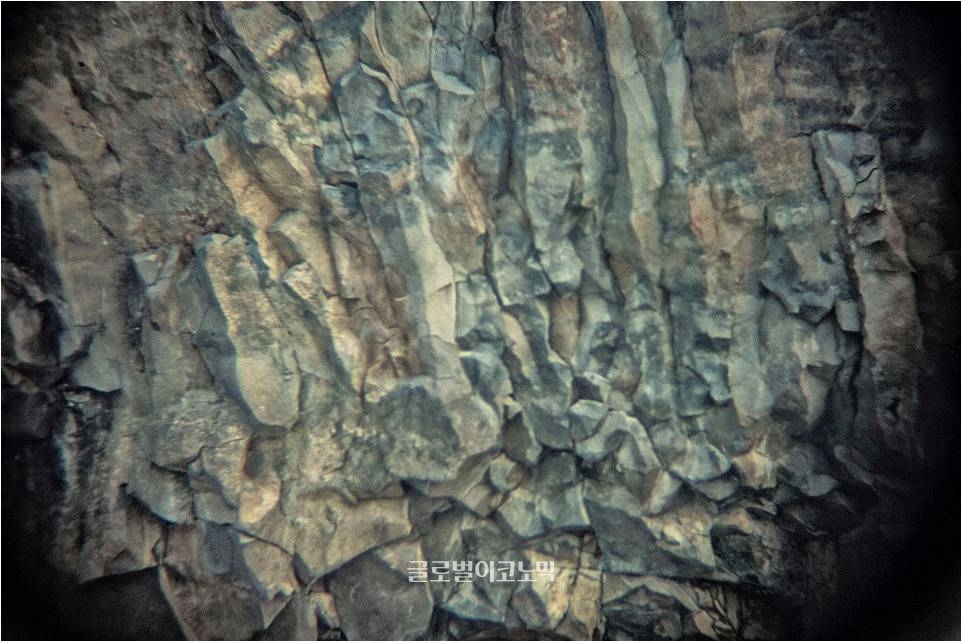




![[뉴욕증시] S&P500·나스닥 하락, 다우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70205212404902be84d87674118221120199.jpg)

![[초점] 아마존, 창고 로봇 100만 대 넘어…사람과 '동료'에서 '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70119212508076fbbec65dfb11612281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