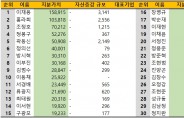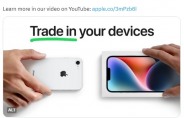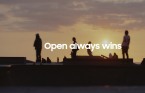혁신이론으로 대표되는 죠지프 슘페터의 창족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개념은 바로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진화론에서는 도구를 활용하는 인류(Homo Faber)의 등장이 바로 최초의 혁신이었다. 현대 인류의 가장 진보한 도구는 인더스트리 4.0을 주도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부의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경영환경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이익 감소와 자본 잠식 후에 천천히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는 급속한 기술변화의 소용돌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천천히 죽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어갈 수 밖에 없다. 미래의 일이 아니고 중소기업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전문기술 분야에서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노키아, 코닥, 소니는 혁신하지 못한 기업으로 경영학 책에 단골로 등장한다.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이들은 혁신하지 못한 기업이라기보다는 혁신의 딜레마(Christensen, 2000)에 빠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그들의 성공경험이 그들을 더 이상 혁신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다 못해 끌어 내린 것 같아 보인다. 이제 지속 가능한 혁신은 단순한 기술력과 한번의 혁신(어쩌다 혁신)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으며, 기술혁신을 담은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기술혁신 조직문화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리더들이 자신의 멘탈모델(Mental Model)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알아차리는 자기인식(Self awareness)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혁신의 딜레마에 빠진 리더들의 동일한 특성은 자신의 성공경험으로 회귀(回歸)하려고 하는 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 관성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회의(懷疑)해 보는 것이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의심해 보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고 타당성 있는 의견들을 수용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래 유망 기술로 전망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을 필두로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 바람이 한 차례 서점가를 휩쓸고 갔다. 경영자들은 앞 다투어 기술 혁신과 효율화를 강조하며 기술경영 전도사가 된 듯하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비즈니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의 R&C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하나둘씩 밀어내다 급기야 남들의 일로만 치부해 버리고는 기존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ICT 디바이스 유통업을 하며 중개 마진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회사가 블록체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라고 비관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이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융합은 아는 것에 아는 것을 합쳐야 가능하다. 이제는 하나의 단순한 지식으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둘 이상의 지식을 융합하여 기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자에게 개발능력은 필요 없지만 기술을 이해하고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광범위한 기술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지만 업무에는 알아서 적용하라는 것이 가장 무책임한 경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전략은 기존 사업 영역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BM(Business Model) 발굴의 두 가지 축 선상에서 수립된다. 기술 선도 조직은 캐시카우 영역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우리 조직 R&C의 레버리지 역할을 담당하고 또 새로운 기술 Seeding을 통해 New BM 창출이 가능한 영역 발굴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경영자들이 기술을 이해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조직이 아니라 기술을 메인 롤로 하는 한명의 구성원으로 시작해도 좋다. 성과가 있다면 R&D 조직으로 성장 시켜 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조직의 리더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관료적인 사람이라면 혁신은 커녕 인터넷 서칭을 통해 찾은 PDF 자료를 PPT 보고 자료로 변환하는 기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넷째, 기술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와 같이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를 활용하는 본질은 가치의 창출이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가치는 경쟁가치, 효율화가치, 고객가치로 마이클포터의 경쟁전략에 비유하면 차별화 우위, 원가 우위, 집중화 우위이다. 즉, 경쟁가치(차별화 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역량 육성, 효율화가치(원가 우위)를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그리고 이러한 경쟁가치와 효율화가치를 바탕으로 고객가치(집중화 우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고객가치는 기존 고객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잠재 고객까지 고려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기술조직과 경영조직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로써 정착해야 한다.
문화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일치 속에서 형성 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안 되면 시스템은 동작할 수 없듯이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법제도와 국민들의 마인드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작동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문화는 기업의 제도와 프로세스 안에서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결집되었을 때 비로소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역량과 관련된 기술자격제도를 만들고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기술역량 기반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역량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또한 기술조직과 경영조직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면 될 것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라! 이제 경영은 경영자, 기술은 기술자가 하는 시대가 아니다. 기술과 경영의 융합을 통한 기술 중심의 경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또한 혁신하는 조직문화는 Bottom up으로 만들어 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기술기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싶다면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스폰서십을 바탕으로 Top down되어야만 가능하다. 리더의 의지가 없는 조직에서 과연 누가 혁신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박동국 한국HR협회 HR칼럼리스트(SK네스웍서비스,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