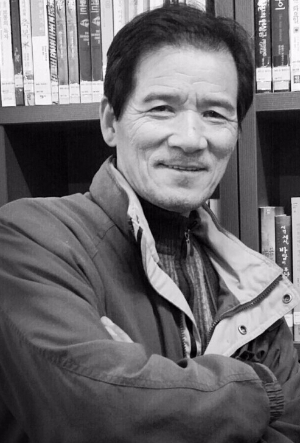
높은 산에서 시작되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가을단풍과 달리 봄꽃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 점점 높은 곳을 향한다. 그런 까닭에 꽃샘바람 매운 날에도 발밑을 찬찬히 살피면 작고 앙증맞은 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중에도 이른 봄의 풀밭에서 볼 수 있는 큰개불알풀의 꽃은 파란 색의 꽃이 여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다. 보랏빛이 감도는 네 장의 파란 꽃들이 옹기종기 피어 있는 모습이 앙증맞기 그지없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고 예쁜 꽃에 입에 올리기에 민망스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열매의 모양이 작은 두 개의 방울처럼 생긴 탓이다. 그에 비하면 풀밭에 점점이 박힌 듯 피어 있는 꽃을 보고 ‘새의 눈’을 떠올린 서양 사람들이 붙인 버드 아이(Bird's eye)란 영어 이름이 훨씬 낭만적이다. 하나의 식물을 두고도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다. 이명으로 ‘봄까치꽃’이 있다. 큰개불알풀이란 본래의 이름을 부르기 민망해져서 새로 붙여준 이름이다. 이른 아침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처럼 이른 봄날 꽃을 피워 우리에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꽃이니 제법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 싶다.
이른 봄날, 조금만 발밑을 찬찬히 살피면 길가의 풀밭이나 논두렁 밭두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큰개불알풀은 현삼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이다. 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 폭넓은 원산지를 지닌 귀화식물로 주로 남부지방에서 서식하지만 요즘은 중부지방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꽃이다. 이름 앞에 ‘큰’이란 접두사가 붙었지만 실상은 보랏빛이 도는 남색의 손톱만한 앙증맞은 작은 꽃을 피운다. 오죽하면 이해인 시인은 이 큰개불알풀의 꽃을 ‘하도 작아서 눈에 먼저 띄는 꽃’이라 했을까.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이 작은 꽃이 진정 놀라운 것은 새의 눈을 닮은 앙증맞은 꽃도 아니요, 민망한 이름을 얻게 된 열매의 생김새도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인한 생명력이다. 작은 들꽃일수록 모여 피어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큰개불알풀은 무리를 이루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간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만들어 내는 씨앗의 숫자가 수만 개에 이를 만큼 많다는 것이다. 큰개불알풀은 그 많은 씨앗을 무려 넉 달 동안이나 마치 빗발치듯 쏟아낸다.
이렇게 쏟아지는 씨앗을 종자우(種子雨)라 하는데 떨어진 씨앗은 비바람이나 동물들에 의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일단 흙 속에 묻힌 씨앗은 길게는 30년을 버티며 싹을 틔울 준비를 한다. 그리고는 적당한 때가 되면 가을에 새싹을 틔워 겨울을 나고 이른 봄부터 꽃을 피우며 세상에 봄이 왔음을 알린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처음엔 꽃의 예쁜 모습에 끌려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꽃을 알아 가면 갈수록 그 꽃을 피우기 위해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초록목숨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경외심마저 갖게 된다. 그저 바라만 봐도 예쁜 꽃,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불평하는 법도 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꽃들을 보면서 내 빈 틈 많은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꽃이 피는 건 어려워도 지는 건 잠깐이라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오기는 어려워도 가는 건 순간인 게 봄이다. 꽃샘바람이 매워도 환한 낯빛으로 봄소식을 전하는 봄까치꽃처럼 올봄엔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전하고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부동산PF 위기 심화] 금융당국, 저축은행 10곳에 증자 요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40819202509905e30fcb1ba8112187240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