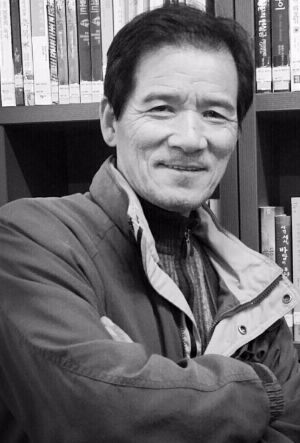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바위틈에 노란 별 모양의 바위채송화가 만개해 나를 반긴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하는 동요를 절로 흥얼거리게 만드는 채송화는 한자로 菜(나물 채) 松(소나무 송) 花(꽃 화)로 쓴다. 채송화는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쇠비름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서 잎이 솔잎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초가집이 많았던 옛 고향 마을에는 집집마다 마당 모퉁이에 키 작은 채송화가 어여쁘게 피어 찾아오는 사람을 반겨주곤 했다. 붉은색·노란색이 대부분인 채송화 꽃 위에 벌들이 꿀을 따느라 분주한 사이, 친구들이랑 검은 고무신으로 벌을 잡던 유년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채송화의 꽃말은 ‘순진’ ‘천진난만’ ‘가련’이다. 석죽목 쇠비름과에 속하는 남미 원산의 일년초로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집 화단이나 대문 앞에 기르는 채송화와 달리 야산이나 바닷가 돌 틈에서 볼 수 있는 바위채송화와 땅채송화가 있다. 그중에서도 바위채송화는 전국 산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로서 산행하는 길에 등산로 주변의 바위틈이나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반양지에서 무리 지어 자란다. 요즘 관상용으로 잘나가는 다육식물을 닮아 잎이 뾰족하고 도톰한 1~2㎝ 크기의 선형이며, 전체적인 키는 약 7~8㎝ 내외다. 꽃은 7월부터 볼 수 있으며, 뿌리에서 올라온 원줄기에서 여러 갈래의 가지가 갈라지고, 가지마다 끝에 한 송이씩 노란 꽃이 핀다. 꽃잎은 5개고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피침형(披針形)이다. 학명은 Sedum polytrichoides Hemsl.으로 돌나물과 꿩의비름속에 속한다.
한편, 분류상 같은 속에 속하는 땅채송화는 바위채송화보다 키가 작고 햇빛이 잘 드는 바닷가 바위틈에 오밀조밀하게 군락을 이룬다. 잎과 꽃 모두 바위채송화보다 작지만, 잎은 둥글고 짧아 구별되고, 꽃 모양도 땅채송화가 더 작고 앙증맞다. 땅채송화는 갯채송화 또는 각시기린초라고도 한다. 바위채송화와 땅채송화는 여러해살이풀로 다육식물처럼 번식을 잘하므로 관상용으로도 쓰이며, 어린 순은 돌나물처럼 식용하기도 한다.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빨강과 노랑 원색의 꽃이 사람의 발길을 잡고, 바위채송화와 땅채송화도 바위틈에 옹기종기 모여 붙어 노란 별을 닮은 꽃을 열어서 지나는 사람들을 쪼그려 앉게 하는 마력이 있다. 박노해 시인이 말한 이른바 ‘풀꽃의 힘’이다.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 찾아가도 나름의 특색을 보여주는 수락산. 아기자기한 암봉들은 저 멀리 설악산이나 월출산을 찾아온 듯한 느낌도 안겨준다. 산 남쪽에는 불암산이 솟아있고, 서쪽엔 도봉산이 의젓하게 마주 보고 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바위채송화와 같은 꽃을 만나는 일은 자연이란 책 속에서 빛나는 문장을 발견하고 밑줄을 긋는 일이 아닐까 싶다. 수시로 장맛비 퍼붓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산정에 피는 바위채송화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 여름을 건너가고 싶다.
백승훈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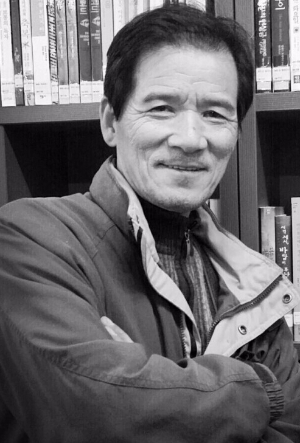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