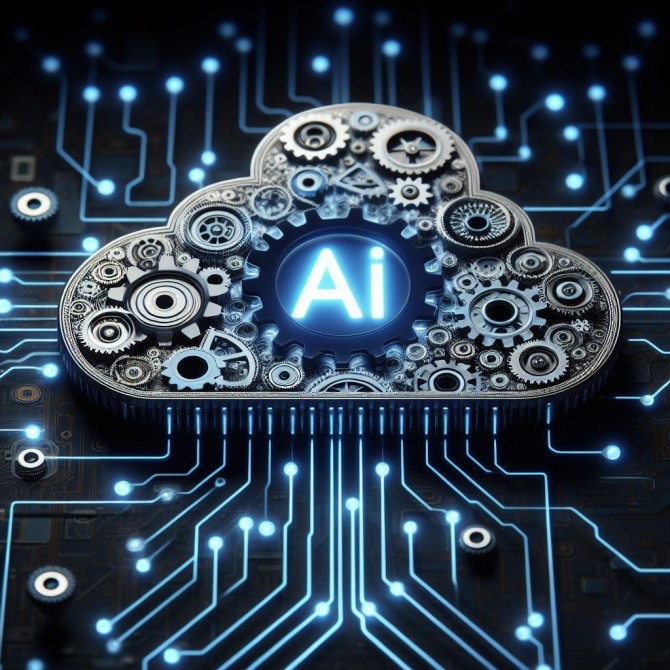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AI 열풍의 수혜를 입은 기업은 엔비디아뿐만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구글) 등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특히 MS는 지난 1월 애플로부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데 이어, 같은 달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약 4000조 원)를 돌파하는 등 엔비디아 못지않게 성공 신화를 다시 쓰는 중이다.
지난해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올해도 그러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MS, 아마존, 구글 등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종에 상관없이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 비즈니스에 도입 및 활용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AI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 및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설 비용 투자 없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컴퓨팅 자원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필요한 만큼만 빌려서 사용할 수 있고, 향후 기업의 성장에 맞춰 언제든 그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장점은 기업들의 AI 도입에서도 빛을 발한다. 기업의 비즈니스 용도로 쓸만한 수준의 AI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려면, 대량의 고성능 서버는 물론, 엔비디아 ‘H100을 기준으로 개당 수천 달러가 넘는 AI 칩을 적어도 수천~수만 개 이상 갖춰야 한다. 물론,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추후 운영 및 유지 비용은 별도다. 이는 잘나가는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 기준으로도 쉽게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이 미리 조성해 둔 AI 특화 클라우드를 임대해 사용하면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 및 운영 비용,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챗GPT’로 AI 업계의 스타로 떠오른 오픈AI가 지난해 MS로부터 100억 달러나 투자받으면서 지분 일부를 MS에 넘긴 것과, 오픈AI의 라이벌로 꼽히는 AI기업 ‘앤트로픽’이 최대 40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를 투자한 아마존과 손을 잡은 것도 이유도 MS와 아마존의 방대한 AI 클라우드를 자사의 서비스 유지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지난해 4분기에만 무려 221억 달러(약 29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엔비디아 역시 AI 클라우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미 지난해 3월 자체 AI 클라우드 서비스인 ‘DGX 클라우드’를 발표하고 7월쯤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10월부터는 기존 클라우드 업체가 아닌, 자체 데이터센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업체와 협의를 시작했다.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AI 칩 판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AI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MS나 아마존 등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고객들에게 자사의 첨단 AI 칩의 기능과 성능을 한발 먼저 제공함으로써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올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올해 약 6788억달러(약 90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시장 규모가 약 5636억달러(약 750조 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올해에만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성장 전망치이기도 하다. 이는 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AI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는 한, 또 한 번의 ‘클라우드 열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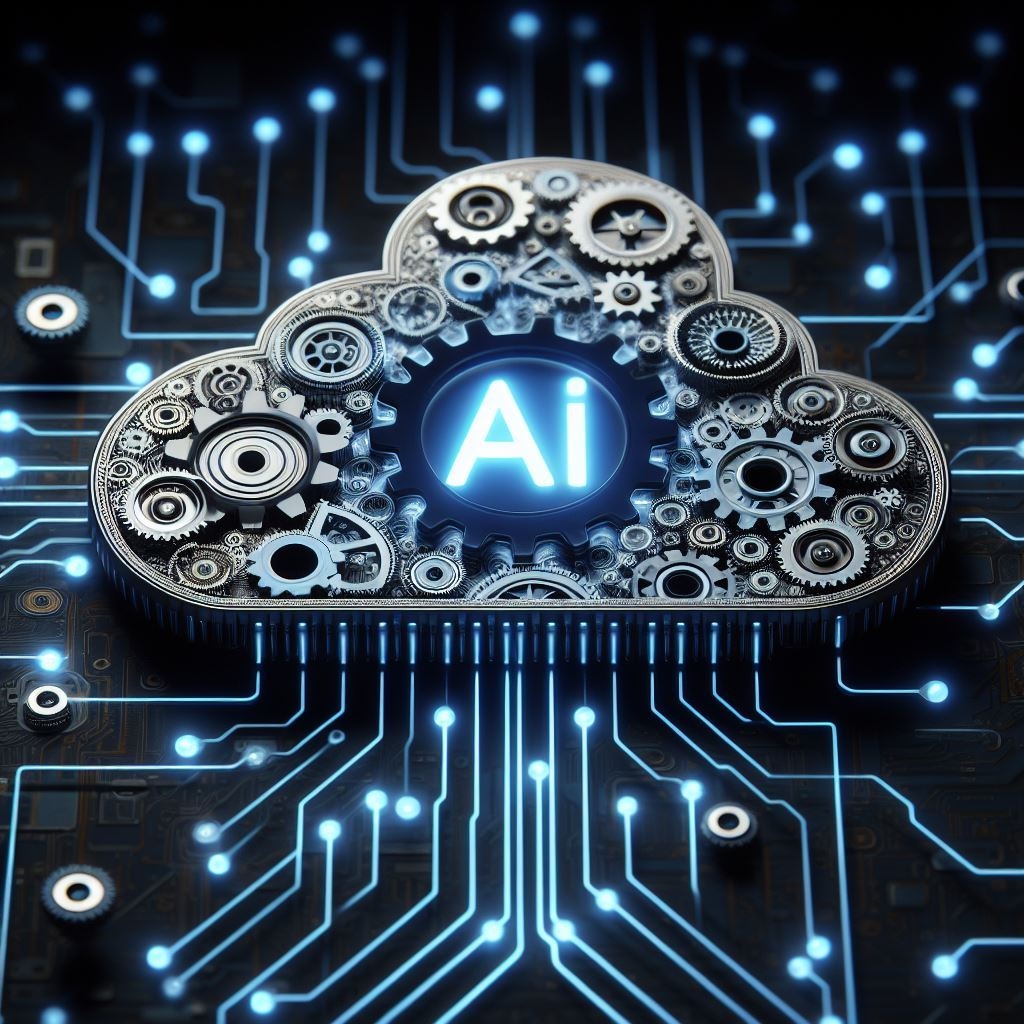



![[뉴욕증시] 1분기 실적·관세전쟁에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40605510809247be84d87674118221120199.jpg)




![[초점] '바퀴'에서 '궤도'로? 獨 자동차 산업, 전쟁 기계 논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519153808527fbbec65dfb11612281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