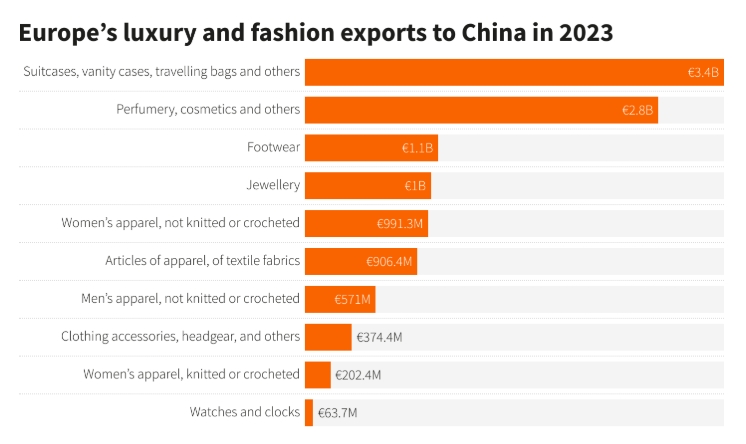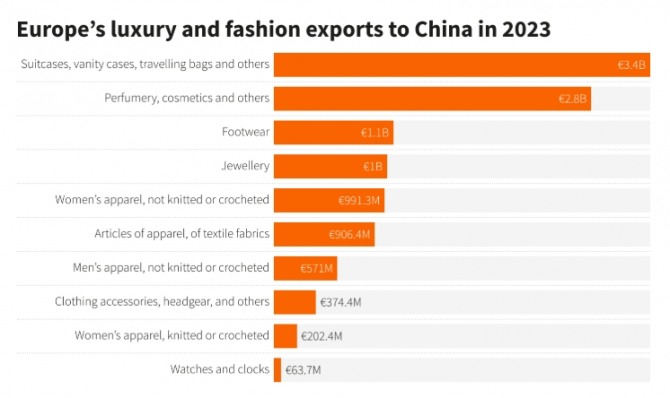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12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명품을 선호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눈을 돌리면서 루이비통, 케링, 버버리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이 타격을 받고 있다.
포춘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명품 시장은 세 배로 성장하며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에게 핵심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특히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음에도 소비자들이 명품 소비 대신 부동산 투자나 여행 등의 분야로 지출을 옮기면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주요 명품 브랜드들의 실적은 지난해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케링의 주가는 39.4% 하락했고, 버버리는 30% 떨어졌다. 루이비통을 보유한 LVMH의 주가 역시 13% 하락했으며, 몽클레르도 7.8% 감소했다.
이같은 소비 패턴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경제 둔화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과 고용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명품 소비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있다는 것. 특히 중국의 도심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23년 6월 기준 21.3%를 기록하며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 전략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포춘은 “2019년 이후 명품 브랜드들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품질이나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마리 드리스콜 명품 소매 분야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들어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가치를 더욱 따지기 시작했고 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젊은 소비자층의 가치관 변화도 명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 명품 소비를 선호했던 중국의 MZ세대들은 최근 들어 ‘소유’보다는 ‘경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BCG의 니콜라스 리나스-카리조사 파트너는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금융 투자나 자신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에 지출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도 명품 소비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동산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며 중산층 소비자들은 주택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유층 소비자들은 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며 고급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