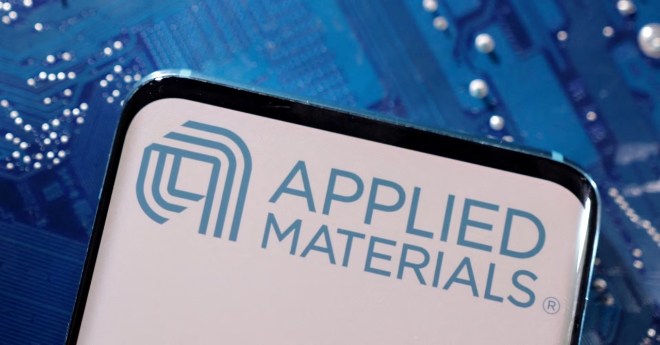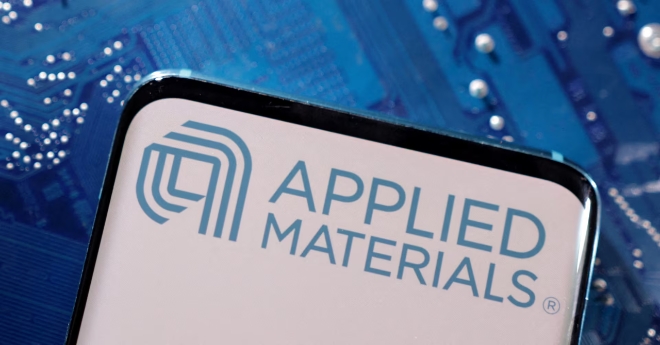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오랜 기간 미국 반도체 업계는 워싱턴의 강경한 대중국 규제가 기업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왔지만 인공지능(AI) 붐으로 꾸준한 매출 상승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주요 장비업체들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이같은 규제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춘은 지적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에도 중국 시장에서 부진을 언급하며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수출 규제 가능성이 실적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최근 분기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22억 달러(약 3조1647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매출 72억 달러(약 10조3572억 원) 가운데 31%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1년 전의 45%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브라이스 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분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1분기 대비 추가로 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 역시 중국 매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램리서치의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14억 달러(약 2조 원)를 기록했다. 전체 매출 대비 비중도 40%에서 31%로 하락했다. 램리서치는 실적 발표에서 "중국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수출 허가 요건 및 기타 규제 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인 KLA 텐코는 중국 매출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이제이아 리서치의 데이비드 추앙 연구원은 "KLA 텐코의 계측 장비는 중국 내 대체재가 부족해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뒤처져 있지만 전기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성숙 칩'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KLA 텐코는 "중국은 여전히 레거시 노드 로직 칩과 메모리 칩 생산의 주요 허브"라며 "세계 최대 통합회로(IC) 소비국으로서의 입지도 확고하다"고 밝혔다.
중국 내 막대한 소비자 수요도 미국 장비업체들에겐 큰 시장이었다. 화웨이, 샤오미, 트랜션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제품 수요는 반도체 수요를 견인해왔다.
미국은 지난 2019년부터 화웨이와 SMIC(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는 포괄적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규제를 요구하며 통제를 강화했다.
초기에는 규제 우려로 중국 업체들이 장비를 대거 사들이면서 미국 장비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외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추앙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규제는 미국 장비업체에 이중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립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미국 기업들의 중국 매출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첨단 장비 생산 역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은 비핵심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으며 구형 장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혁신적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이 중국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