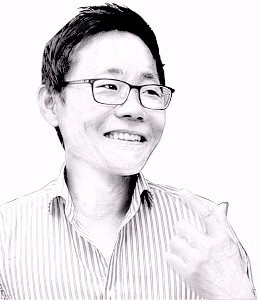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축구판이 시끄럽다. 연휴 기간 중 러시아에서 벌어진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에 대한 기사마다 축구팬들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댓글 안에서 팬들의 마음은 한국 축구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축구인들은 자랑스러워해 마지않을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업적에 대해서도 팬들은 부끄러워했다. 대륙별 최종 예선 한 경기를 남기고 사실상 월드컵 진출이 좌절된 네덜란드와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아르헨티나에게 미안하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우리 팀이 아니라 상대팀을 응원했다는 팬들도 많았다. 월드컵은 총칼 없이 치르는 현대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비유될 만큼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전 지구적 이벤트다. 월드컵이 치러지는 한 달 동안 전 세계는 다함께 들썩인다. 그 전장으로 초대 받은 자국 팀을 팬들이 응원하지 않는다. 축구판이 이상하다.
한국 축구는 2002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2년, 팬들은 월드컵이 축구에서 축제로 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시절, 축구는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와 광장에서 축제가 되었다. 광장에 들끓은 축제의 에너지는 질곡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신명을 선사했고 나라는 잠들어 있던 역동성을 일거에 회복했다. 월드컵을 앞두고 선정되었던 슬로건 ‘다이내믹 코리아’가 전 세계에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한국의 대중문화는 지구촌 곳곳을 물들이며 퍼져나갔다. 긴 정치적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사그라지지 않고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독재정치를 향한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정치의 광장은 2002년을 기점으로 축제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끌어내린 것도 그 공간에서 노래, 춤과 섞여 피어 오른 촛불의 향연이었다. 2002년의 축구는 그래서 축구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을 세계사의 당당한 한 주역의 자리로 쏘아 올린 로켓 엔진이자 주눅 들어있던 우리 안의 끼를 되살린 꽹과리 소리였으며,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임을 자각하게 만든 각성제였다. 15년 후, 축구는 팬들에게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불린다.
히딩크 감독이 이뤄냈던 깨끗한 축구, 팬들은 그것을 원한다. 소위 인맥 축구를 일소하고 실력만으로 유능한 선수를 발굴했던 공정함, 기술이 아니라 체력과 정신력이 문제라고 일갈했던 판단력, 선수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누구나 전장에 서기만 하면 포기를 모르는 늑대처럼 상대를 물고 뜯게 만들었던 지도력, 선수들 간의 선후배 문화처럼 축구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실천력 등 팬들은 그가 이뤄낸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업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의 가치를 그리워한다. 팬들의 절망은, 그 가치의 부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 한국 축구 시스템에 기인한다. 법인카드 내역으로 드러난 축구협회의 부패와 히딩크 감독을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은 절망에 분노를 더했고, 러시아 팀과의 평가전 내용과 결과는 급기야 자포자기의 심정을 낳았다.
월드컵 축구는 축구가 아니다. 그것은 축구로만 남을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탄생했다. 그것은 전쟁의 형식을 빈 축제다. 축제의 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은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패배를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가치에 있다. 15년 전, 팬들은 그 가치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2002년 이전, 월드컵 전장에서의 수많은 패배에도 팬들은 국가대표팀을 향한 응원의 함성을 멈춘 바 없다. 가을은 아직 깊지 않은데 한국 축구는 낙엽보다 먼저 떨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다. 그 바닥에서 봄보다 먼저 파란 싹도 돋아날 것인가.
오종호 (주)터칭마이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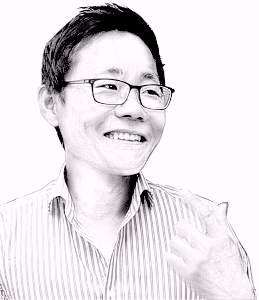





![[뉴욕증시 주간전망] 빅테크 실적 발표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5042003042800204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