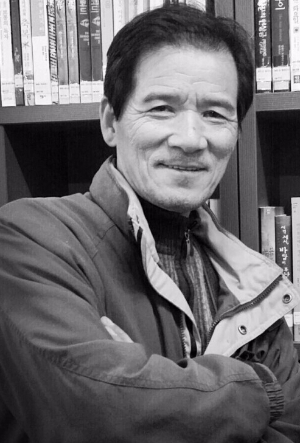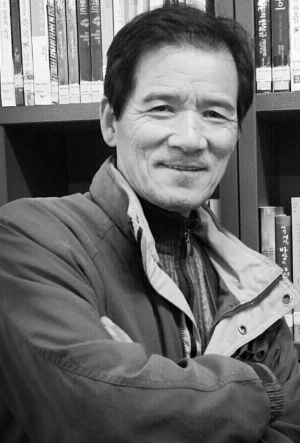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그립고, 마음 기댈 꽃 하나 없는 겨울이 되면 내가 습관처럼 떠올리는 그림이 추사의 ‘세한도’다. 54세에서 63세까지 무려 9년이란 세월을 제주 유배지 대정에서 지내는 동안 고난 속에 있는 스승을 위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보인 제자 이상적에게 추사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건넸다는 그 유명한 그림이다.
조선시대 제주로의 유배는 곧 죽음의 여정이었다. 유배가 풀려 다시 돌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서 유배지 제주까지 도착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다. 오죽하면 모진 풍랑을 헤치고 제주에 도착한 추사가 ‘백 번 꺾이고 천 번 꺾여서 온 이곳’이라 했을까. 그렇게 어렵사리 도착한 추사에게 제주는 가혹한 형벌의 땅이었다. 적거지(適居地) 주위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추사에게 위안을 준 것은 제자 이상적이 늘 푸른 송백(松柏)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보내오는 서책이었다. 그 덕분에 절망감과 고독으로 힘겨웠을 유배생활 중에도 수많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주저앉는 정신을 곧추세우고 한국 문인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세한도’와 추사체를 완성할 수 있었다.
추사의 세한도를 떠올리면 부록처럼 따라오는 꽃이 하나 있다. 추사가 각별하게 사랑했던 수선화다. 요즘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수선화지만 대부분은 원예용으로 개량된 서양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우리 땅에서 스스로 나고 자란 야생 수선화를 보려면 남해안의 거문도나 제주도를 찾아가야 만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 가면 소박하면서도 꽃향기가 아주 진한 야생 수선화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그중에도 수선화가 가장 흔한 곳이 추사 김정희가 유배생활을 했던 남제주군 대정들녘이다. 자동차들이 바삐 오가는 도로변이나 바닷가 언덕, 돌담 밑이나 밭둑을 가리지 않고 눈길 닿는 곳마다 수선화가 피고 또 진다.
추사가 수선화를 처음 만난 것이 24살 때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연경에 갔을 때였으니 그 인연이 자못 깊은 꽃이다. 처음 청순한 꽃을 보고 신선한 감동을 받은 뒤로 수선화 사랑에 빠진 추사는 수선화에 대한 일화를 많이 남겨 놓았다. 43세 때는 평양감사로 있던 아버지를 만나러 평양에 갔다가 마침 연경에 다녀오는 사신이 아버지께 수선화를 선물하자 그것을 달라고 하여 고려청자 화분에 심어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보냈다. 꽃을 좋아하던 다산은 뜻밖의 선물을 받고는 ‘신선의 풍모에 도사의 골격 같은 수선화가 우리 집에 왔다’며 ‘수선화’라는 시를 지어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긴 유배생활에 지친 추사에게 봄의 들머리에 피어나는 수선화는 분명 한 점 희망이자 따뜻한 위로였을 것이다. 그런 때문인지 제주에서 쓴 추사의 글 중에는 수선화를 예찬하는 내용이 많다. 추사는 소담스레 꽃을 피운 수선화를 두고 “희게 퍼진 구름 같고 새로 내린 봄눈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고, ‘한 점 겨울 마음’이라 시로 쓰기도 했다.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엔 “수선화는 정말 천하의 구경거리다. 중국의 강남은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여기는 방방곡곡 손바닥만 한 땅이라도 수선화 없는 데가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제주 사람들에게 수선화는 달갑지 않은 잡초일 뿐이었다. 야생 수선화는 번식력이 강해서 한번 밭에 뿌리를 내리면 다른 농작물의 생장을 가로막을 정도로 무성하게 퍼져 나간다. 좁고 척박한 땅에 온 식구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제주의 농부들에게 수선화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 버려야 할 잡초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같은 꽃을 두고도 보는 이의 처지에 따라 느끼는 감회는 이처럼 확연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황금빛 속꽃과 순백의 겉꽃이 꽃 한 송이를 이루어 금잔옥대(金盞玉臺)라 불리는 수선화의 꽃말은 자애, 자존심이다. 제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다. 세상이 맵찬 눈보라 속이라 해도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며 꽃을 보듯 사람을 대하면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