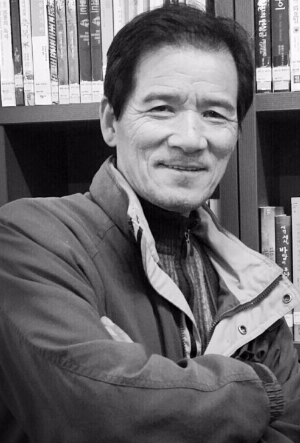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3월이 되면 긴 동면에서 깨어난 대지가 새싹을 밀어올리고 꽃눈을 틔우며 나무들은 헐벗은 가지에 연두색 새잎을 차려입기 시작한다. 벌레 알에도 푸른빛이 돌고 제비도 지난 가을 비워 둔 옛집을 찾아 날아든다. 인디언들의 표현대로 무엇 하나 한결 같은 게 없는, 날마다 새롭고 신기한 것들로 가득한 3월이 되면 어딘가에 꽃이 피어 있을 것만 같아 자주 숲을 찾게 된다.
아직 뺨을 스치는 바람은 맵고, 겨울 빛을 지우지 못한 숲은 잿빛 침묵에 잠겨 있지만 자세히 숲을 살피다 보면 노루귀나 복수초, 바람꽃 같은 야생화를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다. 명심보감에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낳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라고 했듯이 세상에 까닭 없이 피는 꽃은 없다. 꽃을 찾아다니며 내가 얻은 소득이라면 자연은 인간이 소유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써 사는 것이란 깨우침이다. 잔설을 헤치고 꽃대를 밀어올린 복수초나 노루귀꽃을 보면 그 작고 여린 생명의 경이 앞에서 절로 탄성이 터져 나온다. 그동안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분주하기만 하던 마음도 이내 평온해지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으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꽃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른 봄 산에서 야생화를 찾아다니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나무가 있는데 한동안 이름을 몰라 답답했다.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여느 나무들과는 달리 제일 먼저 새 잎을 내어달고 연둣빛 안개에 싸인 듯한 이 나무를 보면 신령한 기운마저 느껴진다. 봄 산에서 가장 먼저 잎을 내어달고 봄을 알리는 이 부지런한 나무가 바로 귀룽나무다. 이름만 들으면 생소하지만 벚나무 등과 함께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예전에는 이 나무의 잎이 피는 것을 보고 농사일을 시작했을 만큼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온 나무다. 귀룽나무라는 이름은 구룡목(九龍木)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명으로는 ‘귀롱나무’, ‘귀롱목’, 꽃이 핀 모습이 마치 흰 구름이 내려앉은 듯하다 하여 ‘구름나무’로도 불린다. 귀룽나무는 주로 정원수로 심는데, 어린순은 나물로 먹기도 한다.
제일 먼저 잎을 피워 숲에 초록기운을 불어넣고, 농부들에게 농사철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귀룽나무는 그 부지런함 못지않게 꽃 또한 아름답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뭉쳐 피는 흰 꽃이 만개하면 마치 흰 뭉게구름이 내려앉은 것처럼 눈부시다. 꽃향기도 그윽하고 꿀이 많아 꽃이 한창일 때 나무 아래로 가면 벌들의 날갯짓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벌떼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벌들에게 아낌없이 꿀을 나누어줄 뿐 아니라 7월에 열리는 버찌와 닮은 흑색 열매는 새들의 먹이가 되어준다. 새들이 귀룽나무 열매를 좋아하여 서양에서는 이 나무를 ‘bird cherry’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귀룽나무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생각이 든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향긋한 꽃향기와는 달리 어린 가지를 꺾으면 고무 타는 듯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파리들이 싫어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어린 가지를 꺾어 넣으면 구더기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가지를 꺾어 벌통 주변에서 흔들면 벌들이 유순해져서 벌통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고 한다. 나무껍질에는 타닌 성분이 있는데 이 정유 성분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란 시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했지만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만나는 일도 그에 못지않다. 그저 한 송이 꽃,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꽃의 생애가, 나무의 전생(全生) 함께 오기 때문이다. 나무나 사람이나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더 알고 싶어지게 마련이다. 봄은 사람의 걷는 속도로 북상하면서 꽃을 피운다고 한다. 남녘엔 이미 봄이 당도했는지 꽃소식이 무성하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잠시 한 그루 나무가 되어보거나 꽃이 되어 보는 일, 눈에 보이는 초록의 생명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을 알아가는 일이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봄을 맞는 자세가 아닐까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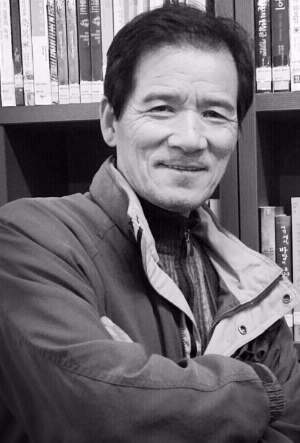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