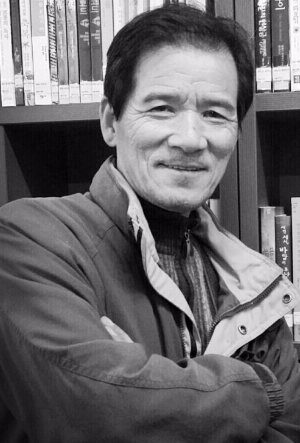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봄나물을 먹어야 봄이 온다고 하시던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봄은 미각을 통해서도 온다. 겨우내 우리를 성가시게 하던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고, 남녘에서 꽃소식이 날아들 무렵이면 나의 어머니는 어김없이 나물바구니를 들고 달래, 냉이, 씀바귀 같은 봄나물을 뜯으러 산과 들을 누볐다. 덕분에 온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는 저녁 밥상 위엔 달래향기 나는 된장찌개나 향긋하면서도 달착지근한 냉이무침이 봄을 타느라 깔깔해진 식구들의 입맛을 돋우곤 했다.
봄바람은 삼라만상을 흔들어 깨우는 자연의 알람시계와도 같다. 초록목숨들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언 땅을 헤집고 초록새싹을 밀어 올리게 만든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가장 먼저 세상 속으로 새싹을 내미는 초록 목숨들이 다름 아닌 봄나물이다. 먹을 것이 귀하던 예전에는 ‘봄나물의 4총사’로 불리는 쑥, 씀바귀, 달래, 냉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봄나물은 곡식에 버금가는 먹을거리였다. 저장 식품으로 근근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춘궁기에 들과 산에 지천으로 돋아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봄나물이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새롭게 눈 뜨는 생명인 봄나물을 뜯는 것이 못내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헛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다행히도 나물은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아홉 살까지 적어도 33가지의 나물이름을 익혀야 했다.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나물 종류를 익히고 요리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신부수업 중 하나였다고 한다. 아흔 아홉 가지 나물노래를 부를 줄 알면 3년 가뭄도 이겨낸다는 속담이 생겨날 만큼 나물을 아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다. 아녀자들이 나물을 캐면서 부르던 구전민요 중에 나물타령도 있다.
한푼 두푼 돈나물/ 매끈매끈 기름나물/ 어영꾸부렁 활나물/ 동동 말아 고비나물/ 줄까말까 달래나물/ 칭칭 감아 감돌레/ 집어 뜯어 꽃다지/ 쑥쑥 뽑아 나생이/ 사흘 굶어 말랭이/ 안주나보게 도라지/ 시집살이 씀바귀/ 입 맞추어 쪽나물/ 잔칫집에 취나물……
나물 종류만도 36가지나 나오는 이 노래를 들으면 해학적인 가사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예전엔 나물서리라는 미풍양속이 있었다고 한다. 날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가난한 아낙들은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온종일 나물을 뜯었다. 광주리 가득 뜯은 나물을 이고 산을 내려오면 나물 중에 가장 좋은 것만을 가지고 마을의 부잣집 마당에 나물광주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안주인을 부르면 안주인은 바가지에 보리쌀이나 잡곡을 가득 담아가지고 나와 곡식을 건네고 대신 나물 광주리를 들고 들어갔다. 흥정이나 실랑이 없이 서로가 건네는 나물과 곡식에 덕담을 얹어 값을 치렀다. 가난한 아낙은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양식을 얻을 수 있고, 부잣집 안주인은 이웃을 도우며 싱싱한 봄나물을 맛볼 수 있는 나물서리는 배려와 상생의 물물교환이었던 셈이다.
종일토록 봄을 찾아 온 산을 헤매어도 봄이 보이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가 피어 있더란 어느 선사의 선시가 생각난다. 봄은 우리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바람으로도 오고, 햇살로도 와서 천지간에 생명의 기운을 가득 풀어놓는다. “평생 나는 삶의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 노력했는데 지나고 보니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라고 말한 것은 프랑스의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여쁜 꽃에게만 주목하지만 식물들에겐 새싹이 돋아나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다. 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들로 나가 봄을 캐며 온몸으로 봄을 느끼고 싶은 요즘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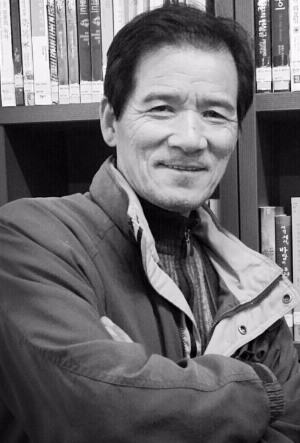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