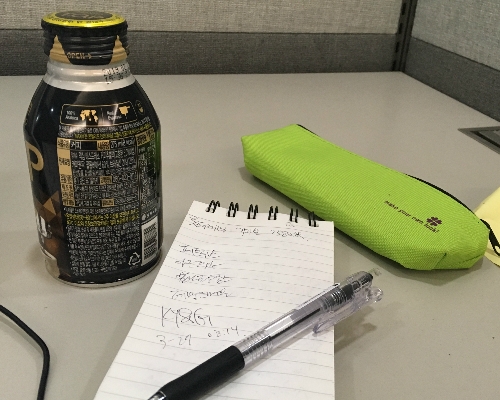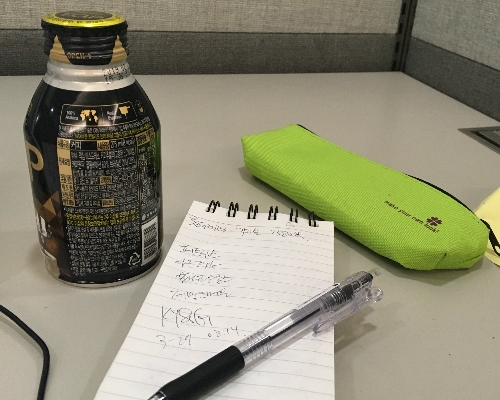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데스크의 불호령이다. 롯데제과 기자실로 출근하자마자 왜 어제(28일) 아침에 내린 지시에 대한 보고를 아직도 안 하냐는 데스크의 잔소리가 있었음에도 또 보고를 소홀한 탓이다. 빠다코코넛과 스크류바, 그리고 지금도 내 가방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후라보노껌의 익숙한 맛으로 기억되는 롯데제과였지만 그곳 기자실에서 일하는 것은 첫날부터 익숙치 않은 실수와 긴장의 연속이었다.
우왕좌왕하느라 오전 내내 정신이 없었다. 기자실이 있는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해 로비를 헤매다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한 내 손은 기자실 도어락 비상벨을 세 번이나 울렸다. 그렇게 허둥대다 오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다. 이 또한 데스크의 점심 식사 문자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면서도 코미디를 찍었다. 데스크가 일러준 구내식당을 못 찾고 1층에서 방황하다 안내문을 보고서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어리바리하며 보고를 못 챙기다 점심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데스크의 호출을 받은 것이다. 대충 이것저것 담은 점심밥이 거의 그대로였다.
그렇게 허겁지겁 입속으로 밥을 쑤셔 넣고 막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또 데스크였다. 회사로 튀어오라는 지시는 취소하지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실수가 이어지면 교육을 안 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사실 육두문자를 안 듣기 다행이다.
보고에 신경을 쓰면서 기사까지 빨리 쓰려고 또 허둥지둥댔다. 점심시간 전, 데스크에게 두 번이나 독촉을 받은 기사는 한시가 넘어서야 겨우 올릴 수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두 가지를 계속 챙기려다 보니 버퍼링이 자꾸 걸리는 컴퓨터마냥 행동이 굼떴다. 보고를 자꾸 안 하는가 하면, 메일함 어딘가에 있을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이제 막 입소한 훈련병으로 되돌아간 기분이다. 긴장의 끈은 팽팽하게 당겨졌으나 실상은 계속 어리바리한 존재 그 자체였다.
어리바리한 훈련병 앞에 선 훈련소 조교는 군인이 되려면 ‘사젯물’을 빼야 한다고 주의를 주면서 관등성명대는 법을 연거푸 가르쳐줬다. 군인이 되는 첫걸음은 누가 툭 치기만 해도 “226번 훈련병 OOO”가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었다. 수습기자에게는 보고가 관등성명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막 수습기자를 시작한 내게 데스크가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은 모든 일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기자는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데스크가 왜 보고 안 했냐는 잔소리를 하기 전에 무언가 정보보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기사를 쓰는 지금도 카톡창은 연신 깜빡인다. 방금 롯데제과 기자실에 홍보팀으로 보이는 이가 기자실 상황을 파악 후 올라갔다고 보고할 참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 기레기(쓰레기+기자)가 아닌 진짜 기자의 업무를 배운다.
"면수습하는 날, 수습기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됩니다. 기대해주시길."(수습기자의 담당 데스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