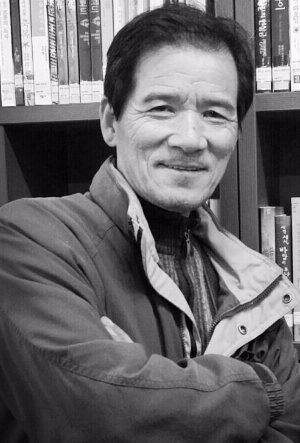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찔레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성 관목이다.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미가 여러 종류의 야생 들장미를 인위적으로 개량한 원예품종이고 보면 찔레는 우리나라의 야생들장미라 할 수 있다. 키는 2m까지 자라고 덩굴성 식물은 아니지만 긴 줄기는 활처럼 늘어져 다보록이 덤불을 이룬다. 다섯 장의 순백의 꽃잎의 중앙에 샛노란 수술이 가득한 찔레꽃은 더없이 청량한 향기를 세상 속으로 풀어놓는다. 꽃 한 송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새로 난 가지 끝에 여러 개가 우산살처럼 달려 피어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 무엇보다 찔레꽃은 향기가 매혹적이다. 옛사람들은 그 향기를 탐하여 꽃잎을 모아 향낭을 만들기도 했고 베갯속에 넣어두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이 없던 시골 처녀들은 말린 찔레꽃잎을 비벼 화장 세수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어여쁜 꽃에 찔레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분명치 않다. 줄기 가득 돋아난 가시 때문에 꽃을 탐하다 보면 영락없이 가시에 찔리곤 하는데 어쩌면 가시에 찔린다는 말이 변하여 찔레가 되었을 거란 추측을 해 볼 따름이다.
찔레넝쿨은 볕을 좋아하여 양지 바른 숲 가장자리의 돌무더기 같은 곳에서 잘 자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다섯 장의 순백의 꽃잎을 펼친 질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찔레꽃은 유난히 흰색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잘 어울리는 한국 토종이다.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찔레꽃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겐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탐하기엔 배고픔이 더 절박해서 어린 찔레 순을 꺾어 먹던 슬픈 추억이 남아 있는 꽃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들밥을 이고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먹었던 찔레순의 맛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머니가 새순을 골라 껍질을 까서 건네주는 찔레순은 달착지근하여 연신 입맛을 다시곤 했다.
찔레 열매는 겨울철엔 새들의 중요한 먹이가 되어준다. 한방에서는 영실, 혹은 장미자라고 하여 약재로 쓰기도 하는데 주로 이뇨, 해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는 물에 넣고 달이거나 가루로 만들어 쓰는데 열매를 술에 3개월 이상 담갔다가 복용하기도 한다.
‘찔레꽃 가뭄’이란 말이 있다. 모내기를 하는 시기, 찔레꽃이 피는 시기에 드는 가뭄을 일컫는 말이다. 한창 모내기를 해야 할 때 가뭄이 드니 이때 피어나는 찔레꽃은 배고픔을 예고하는 꽃이었다. 꽃 피는 시기와 가뭄이 우연히 겹쳤을 뿐인데 찔레꽃 입장에서는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찔레꽃이 필 무렵 비가 세 번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도 있으니 마냥 억울해 할 일만도 아니다. 올 봄엔 심심찮게 비가 내리는 걸 보면 분명 풍년이 들 것 같다.
마흔을 훌쩍 넘긴 뒤에 가수의 길로 들어선 늦깎이 가객 장사익은 어느 봄날 집을 나서다 하얗게 핀 찔레꽃을 보고 거기서 우리 민족의 슬픔을 보았다. 그때 받은 영감으로 서둘러 노랫말을 짓고 곡을 붙인 것이 ‘찔레꽃’이란 노래다. 찔레꽃을 단순한 꽃이 아닌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담고 있는 꽃으로 읽어낸 장사익의 예술적 감각도 놀랍지만 피를 토하듯 내지르는 그의 한 서린 찔레꽃은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절창이다. 이처럼 꽃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그윽한 향기를 전한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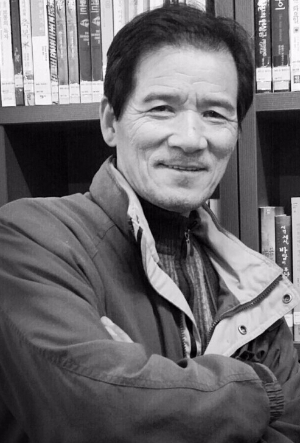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