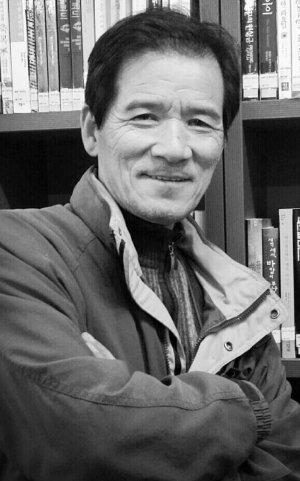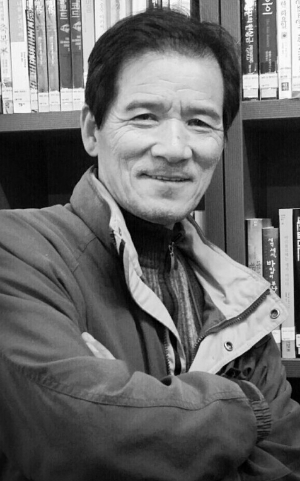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예로부터 사립문 옆에 많이 심어 손님맞이 꽃으로 불리는 접시꽃은 조선시대에는 어사화로 사용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아온 우리에게 친숙한 꽃이어서 능소화와 더불어 울타리 주변에 많이 심었다. 양반꽃으로 불리는 능소화와는 달리 여느 집에서나 심어두고 보았던 접시꽃은 서민적인 순박함이 느껴지는 꽃이다. 접시꽃을 담장이나 울타리 곁에 심었던 것은 자식들이 담장을 훌쩍 넘을 만큼 큰일을 도모하고 입신양명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뻐꾹기 소리 들으며 피었다가 뻐꾸기 울음 잦아들 즈음 지고 마는 접시꽃은 중국이 원산인 귀화식물지이지만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꽃이다. 짙은 향기는 없어도 쨍한 여름 태양 아래 담장 곁에 환하게 피어 있는 접시꽃을 보면 고향집에서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나를 걱정하던 어머니가 그립기도 하다. 그런 만큼 누구에게나 접시꽃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접시꽃이 근래에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된 것은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이란 시의 유명세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신라 말기의 대문장가 고운 최치원도 접시꽃을 소재로 시를 남겼을 만큼 오래도록 시인들의 사랑을 받은 매력적인 꽃이다. 최치원은 ‘촉규화’란 시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거친 밭에 피어난 접시꽃에 비유했다. 당시 골품제 사회였던 신라에서 육두품으로 태어난 최치원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지녔어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꽃은 대하는 사람들에 따라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하고 슬픈 자신의 처지를 닮은 꽃이 되기도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든 상관하지 않는다. 중국 속담에 ‘좋은 술은 깊은 골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은 어디에 피어도 그 고운 자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고향집 담 곁에 피어 있는 접시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접시꽃은 어디에 피어도 아름답고 정겨운 꽃이다. 마을의 어귀나 도로변, 혹은 천변의 둑 같은 곳에서도 잘 자란다. 한 번 심어 놓으면 저절로 번성하여 해마다 우리의 여름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어느 곳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생체리듬에 따라 본능적으로 꽃 필 때를 알아차리고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운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접시꽃은 꽃가루가 많아 벌과 같은 곤충들이 즐겨 찾는 꽃이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이름처럼 납작한 접시를 닮은 접시꽃은 아욱과의 두해살이 초본식물이다. 첫해에는 잎만 무성하게 영양번식을 하고 이듬해가 되어야 줄기를 키우면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 여름 들머리인 6월경에 잎겨드랑이에서 짧은 자루가 있는 꽃이 아래쪽부터 피기 시작하여 점차 위로 올라간다. 꽃의 생김새는 멀리서 얼핏 보면 무궁화꽃과 흡사하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며 꽃잎은 5개가 나선상으로 붙는다. 꽃색은 붉은색, 연한 홍색, 흰색 등 다양하다. 꽃이 질 때는 무궁화처러 피었던 꽃잎을 다시 오므려 통째로 떨어진다. 뿌리는 촉규근(蜀葵根), 씨앗은 촉규자(蜀葵子)라 하여 한약재로 쓰였다.
여름이 와서 접시꽃이 피었는지, 접시꽃이 피어서 여름이 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름이 아무리 뜨거워도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는 일이 아닐까 싶다. 쨍한 땡볕 아래서나, 비에 젖어도 늘 환하게 피어나는 접시꽃처럼.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