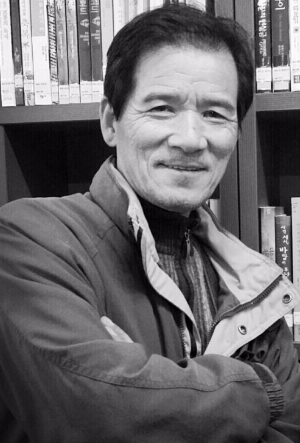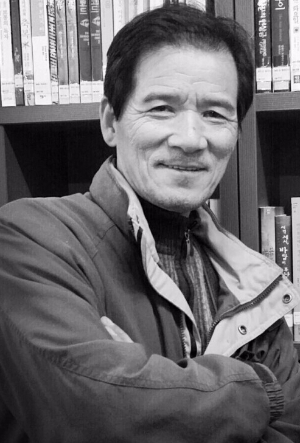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엔 봉선화가 우리 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멀리하기도 하지만 봉선화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시와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와 오랜 세월 함께 해 온 친숙한 꽃이다. 손톱에 들인 봉숭아 꽃물이 첫눈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낭만적인 속설이 생겨날 만큼 친근한 꽃인데도 굳이 호오(好惡)를 따지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반해 물봉선은 우리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토종의 우리 꽃인데도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물봉선은 이름처럼 물을 좋아하는 봉선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주로 물가에 서식한다. 다 자라면 키가 허리춤까지 크고 줄기에는 볼록한 마디가 있고 잎 가장자리엔 톱니가 나 있다. 꽃의 생김새가 봉황새를 닮아 봉선화란 이름을 얻었다는 데 내 보기엔 입이 큰 물고기 아귀와 더 흡사하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꽃의 앞쪽은 한껏 입을 벌린 것처럼 열려져 있고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끝이 도르르 말려 있는 모습이 매우 독특하고 귀엽기까지 하다.
물봉선은 진분홍색, 노랑, 그리고 흰색의 세 가지 꽃이 있는데 색깔에 따라 노랑물봉선, 흰물봉선으로 부른다. 물봉선은 야봉선이나 물봉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한 집안 식구다. 속명은 임페티언스(Impatiens)로 ‘참지못하다’란 뜻이다. 건드리면 바로 터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열매의 특징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을이 되면 작은 꼬투리처럼 생긴 열매가 달리는데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화들짝 놀란 듯 터지면서 씨앗이 사방으로 튀어나간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로 시작되는 유행가가 ‘봉선화연정’이란 제목을 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어여쁜 꽃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물봉선도 애달픈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먼 옛날 올림푸스 신전에서 신들의 잔치가 있던 날, 황금사과 한 개가 없어졌다. 물론 짓궂은 신의 장난이었지만 그날 음식을 나르던 한 여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말았다.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죽고 봉선화로 피어났다. 그래서 봉선화의 씨앗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여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씨 주머니를 터드려 속을 뒤집어 보인다고 한다. 그 때문일까. 봉선화의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다.
어느새 들은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초록의 들판은 서서히 황금빛으로 바뀌어가고 여름 꽃들이 진 자리엔 가을꽃들이 자리바꿈을 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며 가을만을 기다리던 사람들과는 달리 꽃들은 묵묵히 제 시간에 맞추어 피고지기를 거듭하며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은 오만한 이기심으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물길을 가로 막아 거대한 댐을 만들기도 하고, 산을 허물어 골프장을 만들거나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기도 한다. 어쩌면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물봉선의 꽃말은 이 땅의 초록목숨들이 내지르는 절규인 동시에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깨우치려는 자연의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일 때가 가장 자연스럽다는 사실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