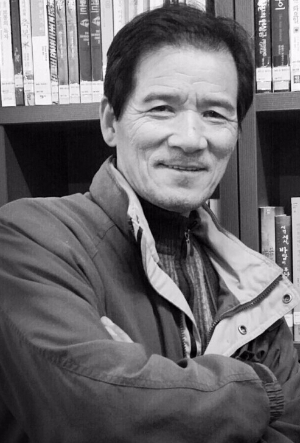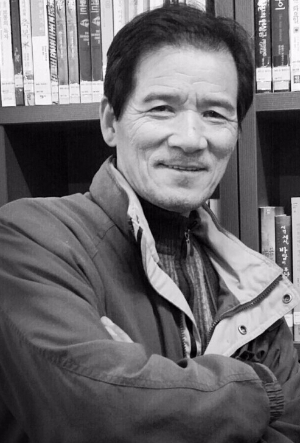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한때 열심히 꽃 이름을 외우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엔 내가 아는 꽃보다 이름 모르는 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진즉에 포기했던 적이 있다. 그만큼 세상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무와 풀이 꽃을 피운다. 그래도 척 보면 이름이 생각나는 녀석들을 만나면 반가움이 앞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단풍이다. 범의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인 돌단풍은 이름처럼 산속의 바위틈이나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남산의 길가에서 만나는 돌단풍은 깊은 산속 계곡에서 만나는 감흥을 주지는 못하지만 작고 흰 꽃송이들의 끼끗한 모습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눈길을 잡아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돌단풍이란 이름은 꽃이 아닌 잎에 바쳐진 헌사이다. 활짝 펼쳐진 잎을 보면 단풍잎의 모양을 쏙 빼닮았다. 다섯 혹은 일곱 갈래로 갈라진 잎은 담쟁이 잎처럼 반질거리는 윤기가 도는데 가을이면 붉은색으로 단풍이 들어 멋스러움을 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 이북 지역에 주로 자라는데 봄이 무르익는 4~5월에 꽃을 피운다.
돌단풍은 봄 햇살이 점차 따뜻해지면 먼저 잎을 피우고 어느 날 불쑥 단풍잎 닮은 이파리 사이로 꽃대를 쓰윽 밀어 올린다. 한 뼘에서 기껏해야 한 자를 넘지 않는 아담한 키의 잎이 없는 꽃대 끝에 작은 별 같은 흰 꽃들이 모여 원뿔 모양의 꽃차례를 이루며 우리의 눈길을 잡아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예전에는 어린잎이나 연한 줄기를 나물로 데쳐 먹기도 했다는데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 그 맛을 알지 못하지만 딱히 궁금하지 않은 것은 계곡의 바위틈에서 꽃을 피운 돌단풍의 멋스러움을 완상하는 것만으로도 넘치는 호사인데 굳이 그 어린 싹까지 뜯어 먹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야생화는 자연 속에서 만나는 게 제일이지만 숲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돌단풍은 정원에 심어두고 보기에 안성맞춤이다. 물가를 좋아하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 덕분에 정원의 돌 틈이나 연못가에 심거나, 고사목이나 돌을 이용한 분경 소재로도 많이 이용된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사랑 받은 덕분에 돌단풍이란 이름 외에도 장장포, 부처손이나 돌나리, 바우나리 같은 다양한 별칭으로도 불린다. 꽃 이름 속엔 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깃들어 있게 마련인데 다양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돌단풍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다치는 법이 없다. 원래 이름이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붙인 것일 뿐 돌단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식물들은 인간이 붙여준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온전히 삶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삶을 바치고 있을 뿐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꽃들의 이름을 부르는 데 인색하지는 않다. 일부러 꽃 이름을 외우려 노력하지는 않지만 산야에서 철 따라 피어나는 꽃들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내가 좀 더 숲에 다가서고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 돌단풍의 꽃말은 ‘희망’이다. 일찍이 시인 오규원은 풀들을 두고 ‘얇고 납작한 나무들’이라 했다. 비록 힘없고 여리지만 저마다 강한 생명력으로 숲을 이루는 초록목숨들에 대한 찬사가 아닐까 싶다. 꽃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숲으로 다가서는 일이자 희망을 부르는 일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