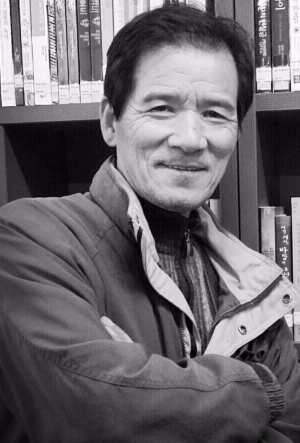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여름 연못의 수련을 볼 때마다 나는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이 질문을 떠올리곤 쓴웃음을 짓곤 한다. 그땐 꽃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므로 지인이 들려주는 수련 지는 법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때문이다. 수련은 여느 꽃들처럼 몇 날을 두고 꽃비를 뿌려대거나 꽃숭어리 뚝뚝 떨어져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지 않는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가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혹은 마음 비운 사이’ 천천히 물속으로 잠겨서 고요히 자취를 감춘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수련을 이야길 할 때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다. 300여 점에 가까운 수련 연작을 남길 만큼 유달리 수련을 사랑했던 그는 엡트강의 물을 끌어올려 연못을 만들고 수련을 심었다. 같은 사물이라도 빛에 따라 변화가 무쌍한 대상에 주목했던 모네에게 수면에 누운 듯 퍼져 가면서 피는 꽃, 빛에 따라 섬세하게 색이 변하는 수련은 더없이 훌륭한 모델이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수련 꽃들이 발산하는 색깔들과 고요한 수면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우주의 신비한 영감을 받았던 그는 연못과 수련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노년을 아낌없이 바쳤다. 고흐에게 해바라기는 삶, 사이프러스나무는 죽음을 의미하는 존재였다면 백내장을 앓으면서도 수련에 몰입했던 모네에게 수련은 그냥 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다.
같은 꽃이라도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 게 꽃이다. 꽃을 제대로 즐기려면 꽃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우선이다. 꽃의 아름다움을 탐하기 전에 그 꽃이 피기까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식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하루가 다르게 태양은 뜨겁게 달아올라도 연못 속의 수련은 그 태양을 향해 눈부시게 꽃잎을 연다. 폭염에 지레 겁먹고 에어컨 바람을 쐬기 보다는 가까운 연지라도 찾아 시시각각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수련 꽃을 보며 수련 지는 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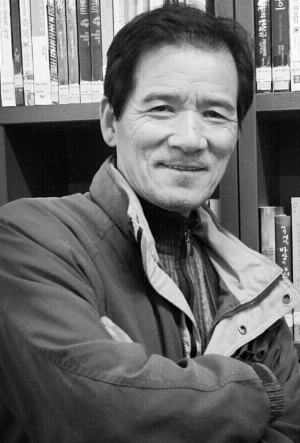









![[뉴욕증시 주간전망] 추수감사절 연휴 속 PCE 물가지수에 촉각...FOMC 의사록 공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112405524409582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