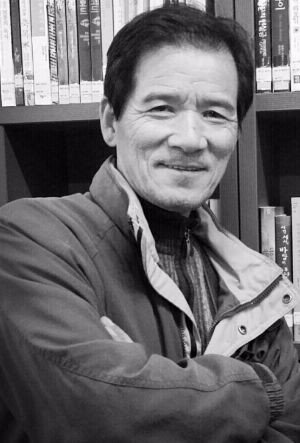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요즘 산들바람이 불 적마다 유백색의 자잘한 꽃을 바닥으로 내려놓는 나무가 있다. 바닥에 가득 떨어져 있는 꽃이 아니었다면 나무의 존재도 모르고 무심히 지나쳤을지도 모를 꽃의 주인은 다름 아닌 회화나무다. 요즘은 가로수로, 조경수로 많이 심어져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나무이지만 예전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귀한 나무 중 하나였다. 예전에 회화나무가 귀했던 까닭은 원산지가 중국인 데다 중국에서도 이 나무를 심으면 집안에 학자나 큰 인물이 나와 집안에 행복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덕분에 학자수(學者樹), 행복수(幸福樹), 길상목(吉祥木)으로 여겨져 왔다. 그뿐만 아니라 옛 중국에서는 이 나무에 진실을 가려주는 힘이 있다고 하여 송사를 진행할 때 재판관은 반드시 회화나무 가지를 들고 재판에 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우리 선조들도 이 나무를 상서로운 나무로 여겨 아무 데나 심지 않고 궁궐이나 서원, 명문 양반가에서나 심을 수 있었다.
콩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인 회화나무는 자잘한 유백색의 꽃들이 큰 꽃송이를 이루고 다시 그 꽃송이들이 나무 전체를 환하게 만든다. 하지만 꽃빛이 화려한 색이 아니라 연둣빛 도는 유백색의 은은한 빛깔이어서 '빛나되 눈부시지 않다.'는 '광이불요(光而不曜)'의 기품이 있는 꽃이다. 꽃이 지고나면 콩과의 나무답게 손가락 길이 정도의 콩꼬투리를 닮은 열매가 달린다. 회화나무 꽃은 혈압을 낮추는 데 효험이 있고 열매는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고 전해진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비록 중국이 고향이라고는 하나 회화나무는 우리나라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수백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들도 제법 많다. 그리 오래도록 우리 곁을 지켜온 나무임에도 내가 회화나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나희덕 시인의 '해미읍성에 가시거든'이란 시를 통해서였다. 자연이 아닌 책을 통해 알게 되긴 했지만 시를 읽고 무작정 그 회화나무를 보기 위해 해미읍성을 찾아갔을 만큼 내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가시 돋친 탱자울타리를 따라가면/ 먼저 저녁 해를 받고 있는 회화나무가 보일 것입니다/ 아직 서 있으나 시커멓게 말라버린 그 나무에는/ 밧줄과 사슬의 흔적 깊이 남아 있고/ 수천의 비명이 크고 작은 옹이로 박혀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몸을 베푸는 방식이 많기도 하지만 하필/ 형틀의 운명을 타고난 그 회화나무,/어찌 그가 눈멀고 귀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길상목으로 여겨지는 회화나무지만 해미읍성의 회화나무는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던 교수목으로 사용된 비극의 역사를 간직한 비운의 나무다. 창경궁에도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한 사도세자의 죽음과 마지막 길을 지켜 본 회화나무가 두 그루 서 있다.
회화나무에게 상서로운 기운을 불어넣은 것도 사람이고, 그 나무를 형틀로, 교수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사람이다. 나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한 자리에 서서 묵묵히 지켜볼 뿐이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2'란 시에서 '이름을 알고 나면/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고 했다. 나무나 풀이름을 알아가는 일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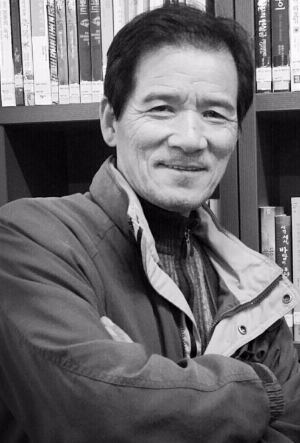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