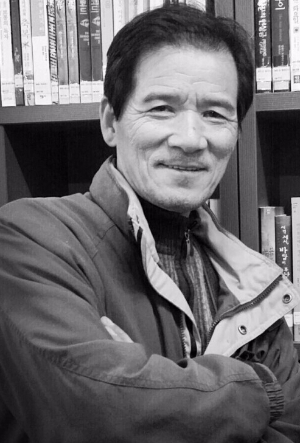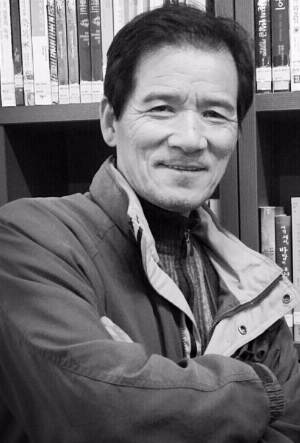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해국(海菊)은 이름처럼 바닷가에 피는 야생국화다. 가을 산야에 흐드러지던 산국, 감국, 구절초, 쑥부쟁이와 같은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찬바람 매운 겨울 들머리에서,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서울 도심에서 해국을 만나게 될 줄이야. 뜻밖의 만남이어서 반가움이 더 컸다. 꽃들이 거의 사라질 무렵에야 절정을 이루는 꽃이지만 해국은 한여름인 8월부터 피기 시작하여 지역에 따라선 12월에도 꽃을 볼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바닷가에 사는 식물답게 강한 바닷바람을 견디느라 낮게 엎드려 꽃을 피우고 둔한 톱니가 있는 두툼한 잎엔 보송한 솜털이 나 있다. 꽃은 연한 보라색으로 지름은 3.5~4㎝ 정도로 얼핏 보면 쑥부쟁이와 많이 닮았다. 또한 해국의 특징 중 하나는 반 목본성으로 원래는 여러해살이풀이었지만 줄기와 잎이 겨울에도 죽지 않고 겨울을 나면서 목질화 되어 나무도, 풀도 아닌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바위절벽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억척스레 꽃을 피우는 해국은 그늘지거나 습한 곳이 아니면 어디서나 잘 자라서 화단의 지피식물로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해국의 멋스러움은 바닷가 절벽이나 바위틈에 무리지어 피어있는 모습을 보아야 제대로 느낄 수 있겠지만 꽃은 어디에 피어도 아름다우니 화분에 심어두고 보아도 좋다.
으레 아름다운 꽃들이 그러하듯이 해국에도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남편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떠났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딸을 데리고 갯바위 위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높은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뒤늦게 남편이 돌아왔을 땐 아내와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듬해 가을, 슬픔에 빠진 남편은 높은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웃고 있는 꽃을 발견하고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꽃 속에 아내와 딸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은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아내와 딸이 꽃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해국의 꽃말은 ‘기다림’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찬바람에 낙엽이 지고 비에 젖어 꽃들이 서둘러 자취를 감추는 요즘, 아직 꽃에 허기진다면 남쪽 바닷가를 찾아서 해국을 만나보길 강권한다. 비록 꽃의 시간은 짧지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난 꽃의 기억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해국을 떠올리면 나는 몇 해 전 여름 울릉도의 바닷가 풍경이 떠오르고, 어느 가을날, 비 내리는 부산 용궁사의 파도소리가 되살아나곤 한다.
마음 가는 곳으로 눈길이 간다는 말처럼 눈길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문다. 사람들이 내게 꽃을 좋아하는 까닭에 관해 물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처음엔 그저 꽃이 아름다워서 보기 시작했지만 꽃을 보는 동안 내 안이 향기로워지기 때문이라고. 꽃을 보듯 사람을 대하고 꽃을 생각하듯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추운 겨울이 좀 더 따뜻하고 향기로워지지 않을까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