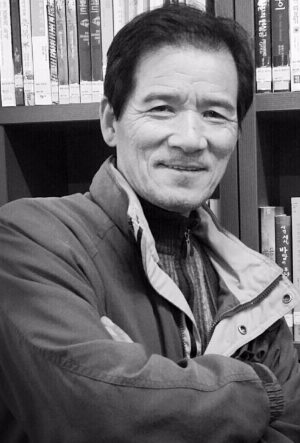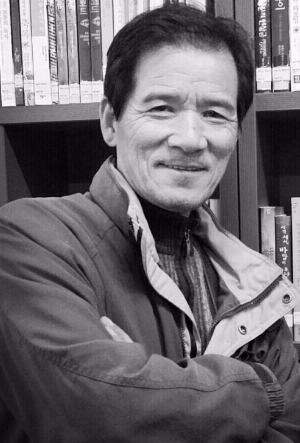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어지는 가을날이 가장 화려하지만, 잎을 모두 내려놓고 맨몸으로 겨울을 나는 모습도 그 못지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서울시 기념물이기도 한 방학동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550년 쯤 된 노거수다. 암수 딴 그루인 은행나무 중 수나무라서 은행이 열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도 않고 도봉구의 상징목으로서 근엄하고도 의젓한 풍채를 자랑한다. 연산군이 유배지인 강화에서 죽어 이곳으로 옮겨온 게 520여년 전이니 이 은행나무는 바람에 실려 온 연산군 생전의 폭정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간혹 사람들은 한 번 뿌리내리면 그곳이 어디이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인간이 생겨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지구에 살아온 나무들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싶은 것이다. 늙은 어머니가 자식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차리듯 나무들은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 우리들을 다 헤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늙을수록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나무뿐이라고 했던 어느 칼럼니스트의 말이 생각난다.
은행나무는 신생대의 화석에서 발견될 만큼 오래된 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는 양평 용문사에 있다. 수령이 1100년에서 1500년 정도로 추정되니 기껏해야 100세를 사는 사람은 비교 대상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은행나무 노거수들이 존재하는데 내 기억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충북 영동의 영국사 은행나무다. 수령이 천년쯤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다. 그곳이 고향인 한 시인은 천은사(천년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조직하여 은행나무를 소재로 전국의 시인들을 불러 모아 시화전을 하고 은행나무 시제를 지낸다. 해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아래에서 가장 멋스러운 풍류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방학동의 은행나무는 노거수로 수형이 아름답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할 때 장목으로 쓰일 뻔 했으나 사람들이 진정을 넣어 화를 면했다. 오래된 노거수로써 수형이 아름다워 일찍이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나 나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병들기 시작했다. 다행히 나무를 살리기 위해 근처의 빌라를 허물고 원당샘 공원으로 개발하여 나무는 해마다 새잎을 내고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은행나무 가지 끝에 빈 까치집이 하나 있다. 늙을수록 고귀해지는 것은 나무뿐이다. 또한 모든 생명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만 하는 나무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냥 바라만 뵈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무 그늘 아래 들면 그보다 좋은 휴식 장소도 없다. 나무를 좋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무를 닮아가게 마련이다. 말없이 비바람 눈보라를 맞으며 묵묵히 묵언수행 중인 나무를 보면 나도 문득 나무를 닮고 싶어진다. 그 나무 아래 들면 초록 잎이 돋아날 것만 같은 착각이 일기도 한다. 우리에게 맑은 산소를 공급해주고 우리의 찬 구들장을 데워주고 우리의 집 짓는 재목이 되어주고 우리를 쉬게 해주는 쉼터가 되어주는 나무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