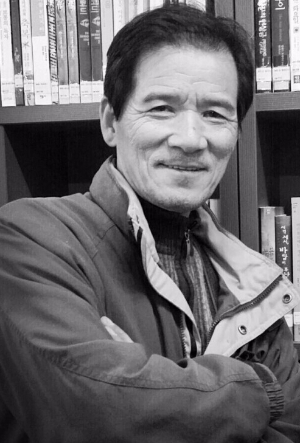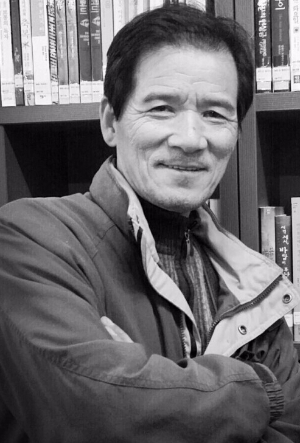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숲은 여전히 겨울빛을 간직한 채 침묵에 잠겨 있고, 직립의 나무들 사이로 한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간다. 봄이 오기 전, 겨울 숲의 주인공은 단연 나무다. 겨울 숲에서 만나는 나무들은 숲의 민낯을 보여준다.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줄기에서 가지 끝까지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봄부터 가을까지 새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단풍 든 잎을 바람에 날리기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낯선 느낌으로 다가오는 겨울나무들. 나무들의 수피를 쓰다듬으며 독특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나무의 수피를 살펴보고 나무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재미도 쏠쏠하다.
천천히 걸으며 유심히 나무들의 가지를 살펴보지만 아직은 어디에도 봄의 낌새는 느껴지지 않는다. 나무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겨울눈 속에 봄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 모양이다. 나무의 겨울눈을 살피는 것도 재미있다. 겨울눈은 나무가 꾸는 봄 꿈이다. 겨울은 나무들에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계절이다. 겨울을 이겨 내기 위해 나무들은 다시 올 따뜻한 봄을 꿈꾸며 줄기와 가지 끝에 겨울눈을 만들어 겨울은 난다.
겨울눈엔 ‘잎눈’과 ‘꽃눈’이 있는데 잎눈은 잎의 압축된 정보를, 꽃눈은 꽃의 압축된 정보가 담겨 있다. 나무는 이 작은 꿈의 비밀창고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련이다. 마치 모피를 두른 것처럼 두꺼운 털옷을 입고 있다. 벚나무는 비늘로 엮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고 칠엽수는 여러 겹의 끈끈한 기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겨울눈은 나무의 지문과 같아서 잎이나 수피로는 헷갈리는 나무도 겨울눈을 보면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다.
햇살에 얼었다 녹은 길 위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다. 길은 그렇게 사람들의 발자국을 받아 새기며 사람들의 발소리를 기억한다. 볕 바른 길섶으로 황새냉이, 개망초 같은 로제트 식물들이 이따금 눈에 띈다. 겨우내 바닥에 바짝 몸을 붙이고 찬바람을 이겨낸 야무진 녀석들이다. 우수가 지나며 숲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록이끼다. 바위에, 나무에 이끼의 초록이 싱그럽다.
숲길을 걷다보면 고사목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병들거나 지난여름 태풍을 못 이겨 직립의 삶을 마감한 나무들이다. 죽은 나무엔 어김없이 버섯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나무는 죽어 쓰러진 뒤에도 버섯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를 키운다고 한다. 흙에서 태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의 나무의 생애를 찬찬히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한층 깊어질 것 같다.
한순간, 어디선가 명랑한 물소리가 들렸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바위틈을 흘러내리는 냇물이 하얗게 부서지며 내는 소리다. 물낯에 반사된 햇빛이 눈을 질러온다. 물소리에 이끌려 냇가로 다가서니 버들강아지 탐스럽다. 헤르만 헤세는 ‘봄의 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린애들은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것을.//살아라, 자라라, 꽃피라, 희망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내밀라.//몸을 내던지고,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시끄러워도 봄은 오고 있는 게 분명하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