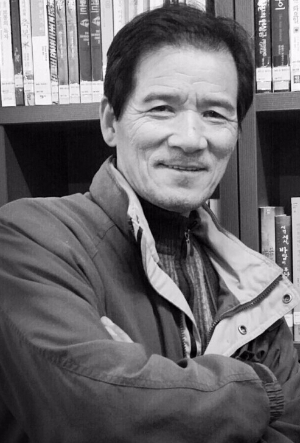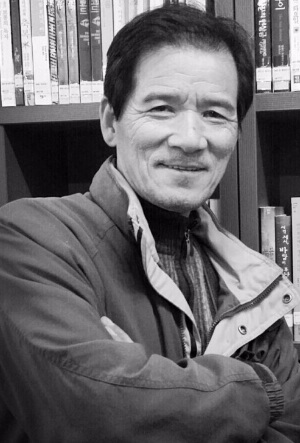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로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요즘은 시내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숲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되레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시끄러운 세상을 등지고 숲길을 걷다 보면 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언뜻언뜻 눈에 띄는 초록 목숨의 소리 없는 환호가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따르면 길이 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을 걸어가면 새로운 길이 생기는 곳이 또한 숲이다. 어느 철학자는 인문학을 ‘사람의 무늬’를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했다. 인류 이전부터 존재했고 인류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숲은 숙명처럼 사람의 무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당도해 있을지 모르는 봄을 찾아 도봉산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긴 것도 도봉산 입구 계곡에 있는 조선의 선비인 유희경과 부안 기생 이매창의 시비(詩碑)였다. '이화우(梨花雨)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오른 편엔 조선시대 부안기생이었던 이매창(梅窓)의 시가 돋을새김 되어 있고, 물결 무늬로 갈라진 왼편 돌 위엔 '남쪽 지방 계랑의 이름을 일찍이 들었는데/ 시와 노래 솜씨가 서울에까지 울리더군/ 오늘 그 진면목을 보고 나니/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하구나' 하는 촌은 유희경의 시가 새겨져 있다.
두 사람은 부안에서 만나 짧지만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유희경은 곧 다시 서울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영영 만나지 못했다. 이별 후에도 두 사람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서로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다. 일찍이 부안출신 시인 신석정은 이매창, 유희경, 직소폭포를 가리켜 부안삼절(扶安三絶)로 꼽았다. 두 사람의 애틋한 러브스토리를 알고 있기에 어느새 시를 읽는 나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해졌다. 이들의 시비가 이곳에 있는 까닭은 도봉의 산수를 사랑한 유희경이 도봉서원 인근에 임장(林莊)을 짓고 기거하다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안내소를 지나자 길가에 빨간 열매를 매단 채 노란 꽃망울을 부풀린 산수유가 눈길을 잡아 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우뚝 솟은 봉우리를 보며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 보니 맑은 물소리와 함께 개구리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개울가 물웅덩이에 개구리 알이 보인다. 아직 경칩 이전인데 이곳 개구리는 부지런도 하다. ‘쌍줄기약수터’를 지나 단풍나무 몇 그루 서 있는 곳에 이르면 이병주 소설가의 북한산 찬가비가 있고, 서원과 담을 경계로 ‘풀’이라는 시로 유명한 김수영 시인의 시비가 서 있다.
소설가 이병주와 시인 김수영은 동갑내기였다. 시인 김수영은 당시 소설가로 돈을 잘 벌던 이병주가 낸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노래했던 자유의 시인 김수영. 그저 숲이 좋아 산을 찾은 사람이라도 이곳이 시인 김수영이 잠들어 있는 곳이란 걸 알고 나면 도봉산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작가 이병주는 ‘북한산 찬가’라는 시에서 “나는 북한산과의 만남을 계기로/ 인생 이전(人生以前)과 인생 이후(人生以後)로 나눈다.”라고 했다. 산을 만나고 숲길을 걷는 일은 비단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람의 무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