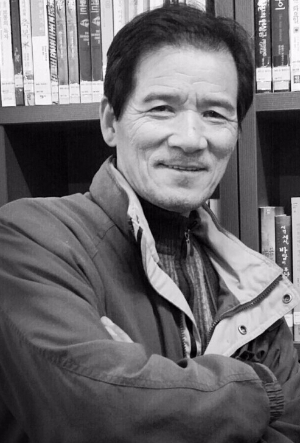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렇다고 온종일 집 안에만 머물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면 가까운 산을 찾아 숲길을 걷는다. 사람들의 거리를 떠나 나무들이 직립해 있는 숲길을 걷다 보면 절로 기분이 상쾌해진다. 집안에서 TV를 통해 쏟아지는 우울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공연히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지만 숲에 오면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나의 무뎌진 오감을 일깨우며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나무 사이로 비껴드는 햇살, 맑은 시냇물과 물낯에 반사되어 되쏘아오는 햇빛의 눈부심이 내 안의 어둠을 단숨에 쓸어낸다.
일찍이 미국의 자연보존론자인 존 뮤어는 "일에 지친 수많은 시민이 산과 숲을 찾고 있으며, 그곳의 공원과 보존된 숲은 생필품이나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삶의 샘으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굳이 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숲은 바라만 봐도 좋은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다. "예방이 가장 훌륭한 치료"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숲을 찾는다. 그리고 일상에서 얻어진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숲으로부터 새로운 기운을 얻어 집으로 돌아간다.
아파트와 빌딩 사이를 지나 숲길로 들어서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진다. 수직의 빌딩들로 가득한 도심과는 달리 숲은 나무와 나무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로 또 같이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온다.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고민과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한 걸음 내딛딜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풍경들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저 아름다운 풍경에 지나지 않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숲이 살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제 막 연둣빛 새싹을 내미는 한해살이풀부터 수백 년을 한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노송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새봄맞이 채비를 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천천히 숲길을 걸으며 새로 피어나는 봄꽃들을 찾아보는 것도 각별한 즐거움이다. 노란 꽃다지나 쇠별꽃, 봄까치꽃은 아주 작아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다. 샘가에서 우무질에 싸인 도롱뇽의 알을 찾거나 개구리알을 발견하는 것도 숲이 살아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숲길을 걷고 있는데 숲 해설가 지인으로부터 변산바람꽃이 피었다며 휴대폰의 SNS로 꽃 사진이 전송되어 왔다. 내가 걷고 있는 숲길 어딘가에도 꽃이 피어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공연히 마음이 바빠지고 발걸음이 빨라진다. 아직 나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은 피었는데 못 본 채 지나쳤거나 아직 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는 꽃은 제 안의 생체시계가 일러주는 대로 때맞추어 꽃을 피우고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오감은 인간 행복의 원천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은 우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검정과 정서를 만들고 경험하기 때문이다. 자연과 멀어지면서 우리의 오감은 점점 무뎌지고 마비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무뎌진 오감을 자극하고 건강한 삶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숲, 내가 숲길을 산책하는 이유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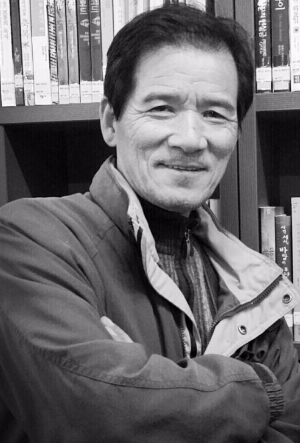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