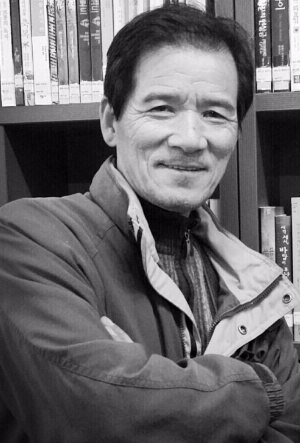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언젠가 TV에서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에 사는 나무늘보에 대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적이 있다.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을 보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로 느릿느릿 움직이는 나무늘보의 삶은 흥미로웠다. 온두라스에서 아르헨티나에 걸친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열대우림 지역에만 서식하고 있는 나무늘보는 세발가락나무늘보와 두발가락나무늘보가 있다고 한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데 발톱으로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나뭇가지를 옮겨 다니는데 평균시속 900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 후각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청각은 둔하고 지능은 낮은 편이다. 하루에 18시간 정도 나무 위에서 잠을 잔다. 야행성으로 잡식성이지만 주로 나무의 새싹, 잎, 열매 등을 먹는다.
나무늘보는 나뭇잎 한두 장으로 하루의 끼니를 해결한다. 대단한 소식가이다. 일 년 내내 울울창창한 열대우림 속에서 나뭇잎 한두 장은 한강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전혀 숲에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자연 파괴의 역사임을 생각하면 나무늘보의 삶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나무늘보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배설을 하는데 그때에만 나무 위에서 내려온다고 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잎사귀를 따먹은 나무 밑에서 일을 본다. 예전의 농부들이 채마밭에 인분으로 거름을 주었던 것처럼.
TV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나무늘보야말로 슬로우 에코 라이프(slow echo life)운동의 선구자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슬로우 에코라이프 운동은 인간은 물론 지구와 생태를 같이 생각하면서 공존의 삶을 모색하자는 운동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버리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구의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찾는 우리에게 나무늘보는 훌륭한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얼핏 권태롭기까지 한 나무늘보의 삶은 슬로우 라이프(slow life), 그 자체이다.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느림은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곧 가난이라는 생각 속에 바쁘게 살아온 덕에 우리는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눈부신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빨리빨리'가 몸에 배이면서 늘 조바심치며 '후천적 여유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
스피드와 경쟁 위주의 삶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와 마음의 안정에 더 큰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 느리게 살기이며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에코 라이프이다. 밀란 쿤테라는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가 속도라면, 느림은 감속의 기법을 다룰 줄 아는 지혜다'라고 했고, 피에르 쌍소는 '느림은 부드럽고 우아하며 배려 깊은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물론 속도가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서 나무늘보처럼 사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절대로 필요한 요즘, 잠시 속도에서 벗어나 느리게 사는 소박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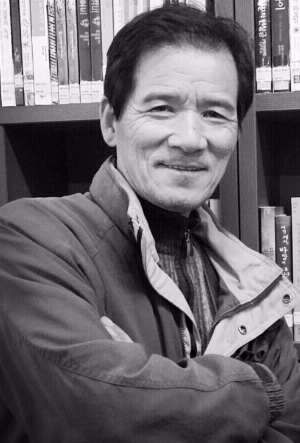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