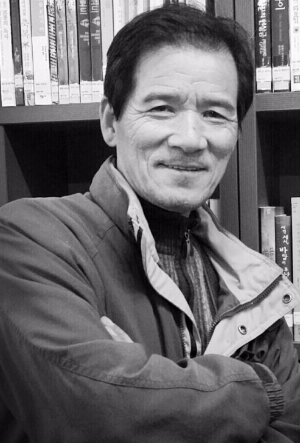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을 오르다가 바위 위에 서 있는 푸른 솔을 한두 번쯤 마주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단단한 바위틈에 뿌리를 박고 선 나무의 기상에 감탄하기도 하고 풍상에 뒤틀린 가지를 보고 삶의 고단함을 엿보기도 한다. 높은 곳에 서 있는 나무일수록 비바람에 휘 고 꺾여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게 마련인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재목으로 쓰기엔 애당초 글렀고 기껏해야 산촌의 어느 집 아궁이의 구들장이나 덥히는 불쏘시개밖엔 안 되겠다고 혀를 차기도 한다.
곡지(曲枝)라는 말이 있다. 곡지란 문자 그대로 비바람에 이리 뒤틀리고 저리 휘어져 버린 굽은 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이 보기엔 볼품없고 땔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 뒤틀린 가지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나무엔 자신의 생에 대한 눈물겨운 몸부림의 흔적이다. 흙 한 줌,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바위틈에서 자라는 나무일수록 그 휘어짐과 뒤틀림이 심하게 마련인데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혹독한 운명과 싸우느라 생겨난 영광의 상처 같은 것이다.
이 세상 어떤 소나무가 일부러 좋은 땅 놔두고 단단한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싶겠는가. 마음 같아선 비옥한 땅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보란 듯이 곧게 커서 화려한 수형을 자랑하는 낙락장송이 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에 대해 투정하지 않는다. 설사 뿌리를 내린 곳이 바람 찬 산꼭대기 바위틈이라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탓하기보다는 다가오는 운명과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한다. 때로는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곧게 자라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가지를 휘 기도 하고 바람을 피해 한쪽으로만 가지를 뻗기도 한다.
사람들은 본래의 수형(樹形)을 버리고 가지를 휜 나무를 탓할지 모르나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뜻을 꺾은 것이라기 보단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이자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뜻을 접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꿈꾸던 세상과는 동 떨어진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삶은 살아내기보단 살아지는 경우가 더 많고 운명은 개척하기보단 견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무나 사람이나 생이 눈물겨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
숲 언저리에 자라는 나무 같지 않은 나무들이 어울린 관목 숲을 임의(林衣)라고 한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 임의가 없으면 숲 속의 키 큰 교목들이 온전할 수가 없다. 그 나무 같지 않은 나무들이 어울려서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어서 숲 속의 키 큰 나무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도 있듯이 키 크고 수형이 빼어난 나무들만으로 숲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나무, 소나무 같은 교목뿐만 아니라 싸리나무나 화살나무, 칡넝쿨이나 다래넝쿨도 있어야 온전한 숲이 되는 것이다. 척박하고 견디기 힘든 자연조건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가지를 휘는 나무들이 있어 숲은 푸르고 무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는 세상도 나무들이 사는 숲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독불장군이 없는 것처럼 수천, 수만의 병사가 있어야 비로소 장군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숨겨져 있게 마련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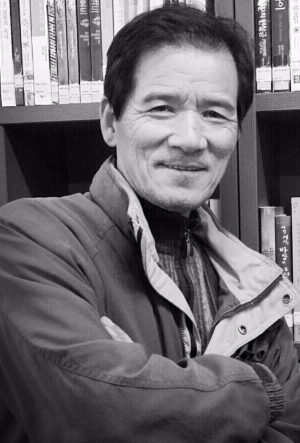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