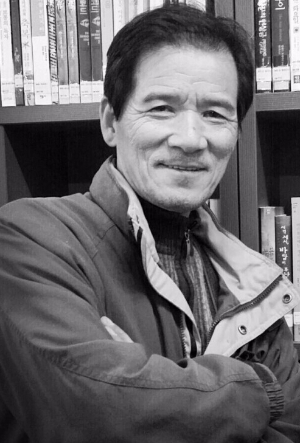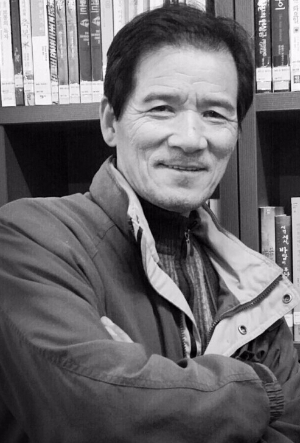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숲으로 가는 길엔 다양한 꽃들이 피어 나를 반겨준다. 굳게 닫힌 초등학교 정문 너머로 보이는 보랏빛 등꽃이 눈부시고 좁은 골목길의 주택 화단엔 붉은 모란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그윽한 향기를 풀어놓는다. 건널목 은행나무 가로수 곁엔 노란 씀바귀꽃이 해실해실 웃고 담장을 넘어온 불두화가 탐스럽기 그지없다. "어딘가로 갈 때 두 발 이외의 무언가를 이용한다면 속도가 너무 빨라질 것이며, 길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 가지의 미묘한 기쁨을 놓치게 되리라"는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는 마치 게으름을 피우듯 되도록 천천히 걸으며 꽃들의 환대를 즐기며 숲으로 간다.
숲길로 들어서면 기분 좋은 풀 향기가 확 나를 덮쳐온다. 어느새 점점홍으로 초록의 숲에 수를 놓던 철쭉도 시나브로 지기 시작하고 신록의 숲은 점점 초록 일색으로 짙어져 간다. 그 미묘한 변화를 살피는 것도 숲길 산책의 묘미다. 멀리서 바라보면 숲은 한낱 고요한 풍경에 불과할지 모르나 정작 그 안은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차 있다. 숲속 어딘 가에선 산비둘기가 울고, 쇠딱다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가 숲을 흔든다. 바람은 수시로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어 이슬을 털어내며 햇빛을 잘게 부수어 숲속에 흩어놓는다. 새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한데 어울려 하모니를 이루고, 풀 향기, 꽃향기가 나무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오월의 숲은 소란스럽기까지 하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숲으로 난 길을 따라 걷는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어느 곳이나 경사가 완만해서 걷는데 힘이 들지 않아 좋다. 숲길을 걸으며 나는 광속과 온라인의 급류에서 벗어나 현실감각을 회복하고 무뎌진 오감을 회복하고 간결해지는 나를 느낀다. 숲길에서 나는 종종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신록의 새 잎을 무성하게 펼친 활엽수들의 우듬지를 바라보곤 한다. 그리곤 나뭇잎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의 찬란함을 만끽한다. 나무들을 올려다보면 허공으로 가지를 뻗고 함부로 잎을 펼친 모습이 일견 무질서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실은 그 많은 나뭇잎들이 공평하게 햇빛을 나누어 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연의 지혜가 신비롭고 경이롭기만 하다.
어제는 쌍둥이전망대에 올랐다. 이 전망대에 오르면 북으로는 도봉산, 서쪽엔 북한산 , 동쪽엔 수락산과 북한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멀리 롯데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산에서 오르느라 흘린 땀을 시원한 바람이 식혀준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맑은 날씨라서 시계가 좋았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숲은 마치 햇솜을 넣은 초록이불을 펼쳐놓은 듯 부드럽고 유순해 보인다. 산을 오르며 나무들의 우듬지를 바라볼 때의 사납게 뻗은 가지와 어지럽게 펼친 이파리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다. 자연을 만끽하고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뿐하다.
19세기 덴마크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쇠렌 키르케고르는 산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날마다 더없는 행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시에 일상의 고통으로부터 걸어 나간다. 내 인생 최고의 사상은 내가 걷는 동안 발견한 것이며 산책길에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운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빛나는 예술'이란 말도 있다. 날마다 숲길을 걸으며 즐거움을 하나씩 보태다 평범한 일상이 즐거운 일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