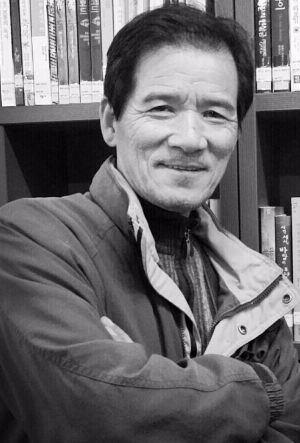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녹음 짙은 숲길로 접어들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건 새 소리다. 쉽게 눈에 띄는 게 까치나 멧비둘기다. 이 녀석들은 산책로를 어슬렁거리며 사람이 다가가도 별로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깡총걸음으로 몇 발짝 물러날 뿐 좀처럼 날아갈 생각을 않는다. 산란기를 맞은 어치나 직박구리, 노랑딱새가 나무 사이를 부산하게 날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다. 그런가 하면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숲 어딘가에선 멧비둘기의 구슬픈 노래가 들려온다. 사람의 성대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듣다 보면 그 소리의 주인공이 궁금해져서 주위를 살펴보지만 맨눈으로는 여간해선 찾을 수 없다. 새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망원경은 필수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언젠가 광릉국립수목원에 갔을 때 그 곳의 숲해설가로부터 해마다 오월이면 광릉숲엔 아주 특별한 비가 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특별한 비란 다름 아닌 벌레비다. 오월이 되면 여리고 맛있는 나뭇잎이 피어나는 때를 맞춰 알에서 부화한 곤충들의 애벌레가 마치 비처럼 떨어져 내린다는 것이다. 굳이 광릉숲이 아니라 해도 숲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떨어져 내린 벌레 때문에 놀랐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숲속엔 수많은 애벌레들이 있다. 누군가는 애벌레가 징그럽다고 몸서릴 치지만 이 애벌레들은 새들에겐 어린 새끼를 키우는 귀한 먹이가 된다. 뿐만 아니라 나뭇잎을 갉아먹고 자란 애벌레들은 나중에 부화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꽃의 수분을 도와 열매를 맺게 해준다.
숲길을 걷다가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도시락을 먹었다. 며칠 전 비가 내려 수량이 풍부해진 계곡엔 크고 작은 바위틈을 지나며 작은 폭포들이 생겨나 물소리가 한결 명랑해졌다. 식사를 하던 중 곤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살짝 건드리니 큰 뿔과 앞발을 휘저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다. 처음엔 이름을 몰랐는데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 탓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여 겨우 이름을 알아냈다. 사슴풍뎅이 수컷이었다. 까짓 곤충 이름 하나쯤 모르면 어떠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름을 알면 한결 친근감이 생기고 그래야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나무와 풀 등 녹색식물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경제활동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입 동화작용을 통해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나무가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를 사람들이 숨을 쉴 때 들어 마시며 생명을 유지한다. 자연생태계는 동물과 동물, 동물과 식물 간,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햇볕은 물론 바람 등 모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다.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의 저자인 노르웨이 생명과학대학교 교수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안네 스베르드루프-튀게손은 “곤충은 이 세계가 돌아가게 해주는 자연의 작은 톱니바퀴다”라고 했다. 우리가 하찮고 귀찮고 징그럽고 위험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작은 곤충 한 마리도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호기심이 사라지면 늙는다는 말이 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숲은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호기심 천국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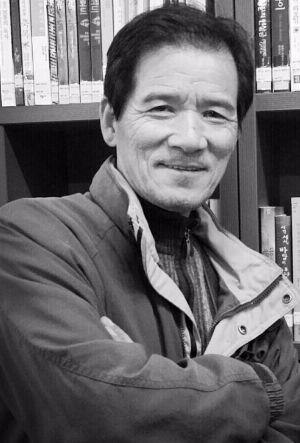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