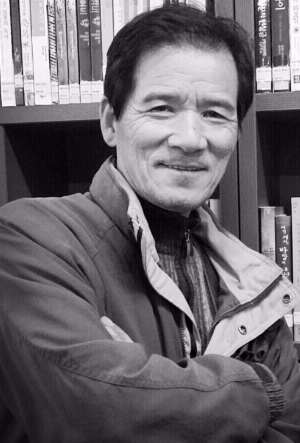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상전벽해라 했던가. 흐르는 세월 속에 병충해와 벌목으로 인해 그 흔하던 밤나무들도 산길로 접어드는 초입에서 몇 그루가 눈에 띌 뿐 고향 숲도 더욱 우거지고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나무꾼들이 오르내려 반질거리던 산길도 사라지고 성묘를 위해 내놓은 길만이 흔적처럼 겨우 남아 있을 뿐이다. 숲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어도 칡넝쿨, 다래덩굴이 바리케이드처럼 나의 진입을 완강히 막아선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도 나는 조심조심 풀숲을 헤치며 숲길로 들어선다. 일 년 중 가장 많은 꽃이 피어나는 유월의 인적이 끊긴 숲은 말 그대로 야생화 천국이다. 버려진 산비탈 묵정밭엔 개망초가 한세상을 이루고 길섶엔 꿀풀과 으아리, 사위질빵, 패랭이꽃이 한창이다. 무덤가 잔디밭엔 타래난초와 나리꽃이, 솔숲엔 연분홍 땅비싸리꽃과 키가 껑충한 보랏빛 붓꽃이 눈길을 잡아끈다. 눈에 띄는 꽃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꽃을 보면 어지러운 세상과는 무관하게 숲의 시계바늘은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일찍 찾아든 무더위에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도심의 열기와는 다르게 숲속은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로 시원하여 청량감이 느껴진다. 정서적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숲속의 온도는 3~7도 정도 낮다고 하니 숲은 천연의 에어컨인 셈이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건너가고 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숲과 자연’이라고 한 소로의 말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 만남이 어려운 탓에 올해는 여느 해보다 숲과 가까이 지냈다. ‘걷기의 역사’를 쓴 레비카 솔닛은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만든다.”고 했다. 마스크를 벗고 잠시 숲속을 걸었을 뿐인데 코로나19로 답답하던 가슴이 확 트이는 듯하며 맑은 생각들이 복잡하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뒤늦게 일행들과 합류하여 벌초했다. 예초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무덤 위의 풀들이 여지없이 쓰러졌다. 쓰러진 풀들을 치우는데 향긋한 풀 비린내가 코끝을 간질인다. 한 차례 땀을 흘리고 나니 잡초가 무성하던 봉분들이 마치 이발을 한 듯 단정해졌다. 벌초를 마치고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 쉬는데 백로가 창공을 가로질러 건너편 솔숲으로 내려앉는 게 보였다. 솔숲을 유심히 보니 백로가 제법 많이 눈에 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백로들이 떼를 지어 둥지를 튼 서식지였다. 얼추 백여 마리는 족히 되는 듯하다. 소나무 가지마다 둥지를 틀고 솜털이 보송한 어린 새끼들이 어미들이 물어다 주는 먹이를 차지하려 연신 울어대어 솔숲이 소란스럽다.
백로들이 둥지를 튼 소나무 줄기가 분변으로 하얗게 덮여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생명을 키우는 일이란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어야 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란 생각에 옷깃을 여미었다. 백로를 보면 ‘가마귀 싸호는 골에 백로(白鷺)야 가지 마라. 셩낸 가마귀 흰빗츨 새올세라 청강(淸江)에 죠히 씨슨 몸을 더러일가 하노라’ 하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썼다는 시조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료진들이 겹쳐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시절 탓인가 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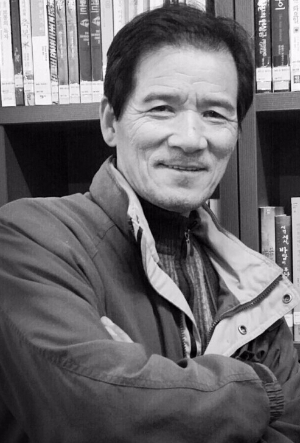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