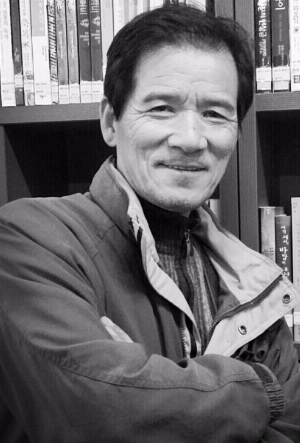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재라도 남지만 홍수가 지나간 자리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실감나는 요즘이다. 매 시간 보도되는 뉴스 화면엔 붉덩물만 넘실거린다. 유난히 긴 장마로 마치 온 나라가 물의 나라가 된 것만 같다. 장마는 순우리말이다. ‘길 장(長)’에 물의 옛말인 ‘마’가 합쳐진 말이라는 설도 있고, ‘삼을 잘 자라게(長麻)’ 하는 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장마를 한자로는 ‘고우(苦雨)’라고 한다.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비’라는 의미다.
기상학적으로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북쪽의 찬 고기압과 만나면서 정체전선을 만들며 뿌리는 비를 가리켜 장마라고 한다. 그 장마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며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 도처를 휩쓸며 물 폭탄을 쏟아 붓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기상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인류는 지난 100년 간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이산화탄소를 늘려가면서 지구의 온도를 1도를 상승시켰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까짓 1도가 올라가는 게 대수냐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몸에 이상이 생기듯 심각한 상황이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서 바다의 증발량이 늘어나 공기 중에 수증기가 7%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으니 폭우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날씨는 적도와 극간의 햇빛의 비춰지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날씨 변화가 일어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상공 중이도를 지나가는 제트기류라고 한다. 한데 북극의 온도가 빨리 상승하면서 그 차이가 작아져 제트기류의 흐름이 둔해진 바람에 저기압이 오래 정체되면서 비 오는 날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기후는 바뀌지 않아야 하고 날씨는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국어사전에서 비에 대해 찾아보면 그 종류가 참 많기도 하다. 햇볕이 나 있는데 잠깐 내리다가 그치는 여우비, 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조금 가는 는개,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이내 그치고 마는 소나기, 장대처럼 굵고 세차게 좍좍 쏟아지는 장대비, 그 외에도 먼지잼, 안개비, 목비, 가랑비, 건들장마, 개부심 등등 수십 가지나 된다. 유난히 표현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측우기를 만들만큼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 민족의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그 많은 비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는 신영복 교수의 저서 ‘담론’ 속 ‘비와 우산’편에 나오는 ‘함께 맞는 비’다. 붓글씨로 써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 신영복 교수의 ‘함께 맞는 비’를 보면 부서(附書)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처지가 다른 상태에서 동정을 베푸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마음엔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함께 비를 맞아봐야 같은 처지에서 같은 마음이 되고 비로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함께 비를 맞는 마음으로 서로의 처지를 헤아리고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도우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야겠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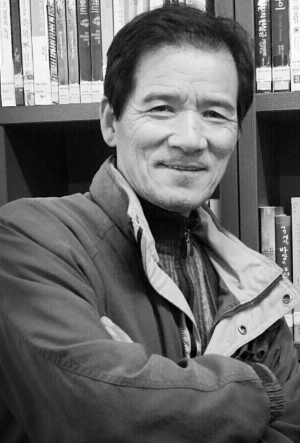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