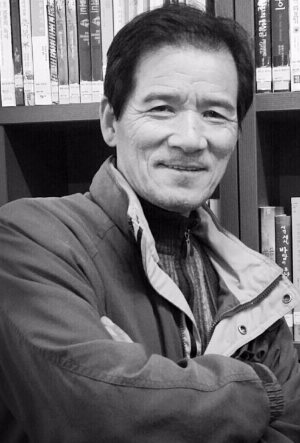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가을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높고 푸른 하늘과 하늘 끝에 피어나는 흰 뭉게구름, 산들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녀린 코스모스의 환한 미소, 가을은 자연의 선물이다. 마치 발신인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연애편지처럼 가슴을 설레게 한다. 가을은 만물이 완성되는 열매가 아름다운 계절이다. 흔히 꽃을 절정의 순간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절정은 잘 익은 열매의 순간이다. 모든 꽃은 다만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해를 따라 돌던 해바라기도 더 이상 돌지 않고 가을햇살에 익어가는 벼 이삭들도 하루가 다르게 고개를 숙인다. 머지않아 들녘은 황금물결로 가득 차 출렁일 것이다.
벌초를 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했겠지만, 시절이 시절인지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선산을 오르는 길목엔 쑥부쟁이가 보랏빛 향기를 흘리고 밤나무 가지엔 주먹만 한 밤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연분홍의 며느리 밥풀꽃도 보이고 키가 껑충하게 자란 미국자리공의 열매는 까맣게 익었다. 예초기가 돌아가며 웃자란 풀들이 쓰러지고 풀 비린내가 코끝을 자극한다. 그 사이를 방아깨비와 메뚜기들이 뛰었다. 이리 튀고 저리 뛰며 바쁘게 풀숲으로 숨는 곤충들의 부산함을 지켜보려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른다.
지금은 도시라는 인공적 공간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가던 나의 유년 시절은 가난했지만,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가을이면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에서 논두렁 사이를 돌아다니며 메뚜기를 잡아 프라이팬에 볶아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뒷동산에 올라 알밤을 주머니 가득 주워 생밤으로 깎아 먹기도 했다. 자연과 더불어 생긴 기억은 이처럼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눈만 뜨면 들로, 산으로 쏘다니며 가을을 만끽하던 그 시절이 마냥 그리운 것은 자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반증인지도 모르겠다.
벌초를 마치고 냇가에서 땀을 씻었다. 누군가는 물소리 깊어지면 가을이라고 했는데 바위 사이를 돌아나가는 물소리 청량하다.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지면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으로 가을을 만나러 가자. 파란 하늘과 금빛 햇살, 그 사이를 불어가는 바람 속에서 가을을 느껴보자.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두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런 현실은 역설적으로 자연과 친해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헤르만 헤세는 ‘자연은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라고 했다. 그동안 자연을 멀리하고 무심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좀 더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코로나블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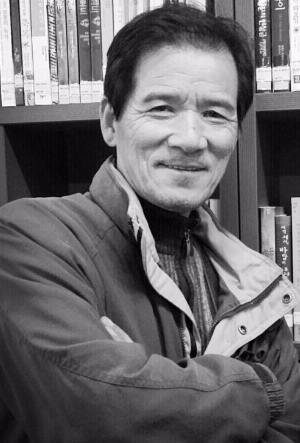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