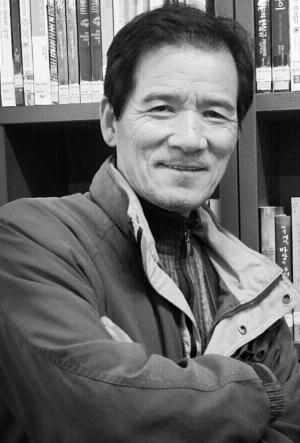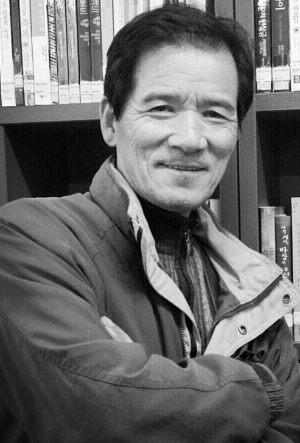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마스크와 미세먼지로 답답해진 가슴을 달래려 북한산을 오른다. 도선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백운대 오르는 산길로 접어든다. 화려하던 단풍이 사라진 12월의 숲은 단정하다. 아직 말라버린 이파리를 달고 있는 단풍나무도 간간이 눈에 띄지만 겨울비와 함께 많은 나뭇잎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땅 위로 내려앉았다. 차디찬 겨울비는 녀석들에겐 거부할 수 없는 최후의 통첩이었을 게다. 아침의 서릿발과 한밤의 냉기를 견디며 힘겹게 매달려 있던 가을 나뭇잎들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이제 낙엽들은 차츰 땅속에 스며들고 어미의 몸인 뿌리에 자신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어느 봄날, 연록의 새잎들이 미풍을 타고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처럼 흔들릴 것을 희망하면서….
그래서 12월의 숲은 비감하면서도 장엄하다. 많은 생명이 스러지기에 비감하고, 그 희생을 통해 새 생명이 잉태되기에 장엄하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한편으로는 숙연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안도한다. 만약 새해의 희망이 없다면 12월은 암울한 절망의 끝일뿐이겠지만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을 품고 있듯이 12월은 언제나 새해로 향해 있다. 억수처럼 퍼붓던 여름날 소나기도,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눈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치게 마련이다.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겨울 숲은 얼핏 잠든 듯하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꿈꾸는 법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피해 등산로를 버리고 왼쪽으로 난 오솔길로 발길을 돌렸다.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마주치는 걸 피하고픈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산악인 추모비 가는 길이란 작은 이정표가 눈길을 잡아끌었기 때문이다. 바닥돌이 반질거리는 등산로와는 달리 추모비 가는 길은 인적 끊긴 지 오래인 듯 낙엽으로 덮여 있다. 오가는 이 없는 호젓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마스크를 벗었다. 골짜기를 내려가는 맑은 냇물 소리 명랑하다. 서늘한 한기를 품은 바람이 기분 좋게 나를 스치고 간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해 본다.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어쉰다. 답답하던 가슴이 트이는 듯하다.
골짜기를 따라 얼마나 올랐을까. 이끼 낀 가파른 돌계단을 지나니 인수봉이 바라보이는 볓바른 곳에 산악인 합동추모비가 서 있다. 북한산 무당골의 산악인 합동추모비는 북한산과 국립공원에 산재했던 산악인 추모비를 한자리에 모은 추모공원이다. 산이 좋아 산을 오르다 산에서 생을 마감하고 산의 품에 안겨 잠든 사람들의 추모비를 돌아보며 나는 ‘설악의 시인’으로 불리던 이성선 시인의 시 ‘산길’을 떠올렸다.
“산길은 산이 사는 길이다/나의 몸은 내가 가는 길/모자 쓰고 저기 구름 앞세우고/산이 나설 때 그 뒷모습 뒤에서/길은 우레를 감추고 낙엽을 떨군다/산의 가슴 속으로 絃처럼 놓여서/새가 날아도 자취를 숨긴다/ 그것은 또 쇠뿔에도 걸리지 않는 /달이 가는 길/ 바람에 씻지 않은 발은 들여놓지 않는다/ 귀와 눈이 허공에 뜨여/도토리 떨어지는 소리 눈 오는 저녁을 간직한다 /산이 나에게 걸어올 때/산길은 내 안에 있다” - 이성선의 ‘산길’ 전문-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