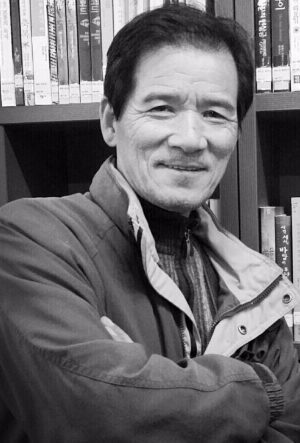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숲길로 들어서자 마른 가랑잎 밟히는 소리가 경쾌하다. 밤새 가랑잎에 내려앉은 흰 서리가 사선으로 비껴드는 아침햇살에 반짝인다. 수많은 사람이 오갔을 텐데도 낙엽 밟히는 소리는 숲의 속삭임처럼 은근하고 다정하다. 새삼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숲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란 생각이 든다. 이 숲이 없었다면 그 엄혹한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만 해도 아득해진다. 봄부터 가을까지 숲을 오가며 만났던 꽃들과 풀과 나무, 그리고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곤충과 동물들이 나의 벗이 되어주고 우울한 나를 달래주었다.
겨울 산행은 꽃을 보는 호사는 눌릴 수 없지만,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다. 잎을 모두 내려놓은 나무들이 묵언수행 하는 수도자처럼 도열해 있는 고요한 산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친 숨소리를 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다. 굳이 바쁘게 서두를 까닭도 없다. 산길에 들었다고 반드시 정상을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겨울 산에서 무리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오래전에 대중음악평론가 이백천 선생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가수 이미자는 노래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70%만 소리를 낸다고 했다. 이유는 100% 다 하면 성대에 무리가 와서 오래도록 좋은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을 오를 때에도 내려갈 힘은 비축해 두어야만 한다.
오래 전 백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을 가두려 했을 때 시애틀 추장이 행한 연설은 자연에 대한 인디언들의 사상을 잘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누이이고 순록과 말, 독수리는 형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대지에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이 삶의 거미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대지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자연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사는 것임을 삶 속에서 깨달은 인디언들의 지혜는 경이롭다. 그들은 우리에게 삶을 버리라거나, 은둔하라거나, 직업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속도에 길들여져 분주함과 스트레스에 눌려 사는 현대인들에게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연에 대해 감사하라고 조용히 속삭인다. 그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억해주길 바란다. 코로나 팬데믹은 통째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연과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산 중턱에 앉아 바라보는 솔빛이 조금은 더 밝게 느껴진다. 늘 푸른 소나무도 항상 같은 색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겨울이 다가오면 솔빛이 검푸른 색을 띠었다가 봄이 가까워지면 점점 밝은 초록으로 빛난다. 추위가 매워 겨울의 중심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리 느낄 즈음엔 나무들은 이미 봄을 준비하고 있다.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 반드시.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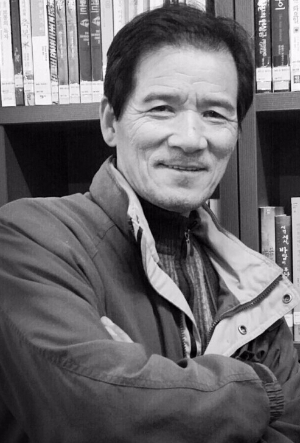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