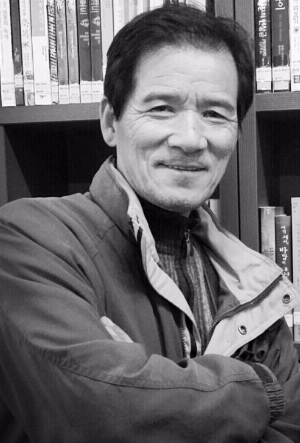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등산은 글자 그대로 산을 '오르는' 것이지만 숲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굳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산꼭대기까지 올라야 할 이유가 없다. 숲의 맑은 공기를 맘껏 호흡하며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펼쳐지는 자연 풍광으로 눈을 씻고 물소리, 새소리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숲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내가 숲이란 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은 오르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숲은 어머니의 품처럼 그 속으로 들어가 안기고픈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옛사람들은 산에 '오른다'는 말 대신 산에 '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행여 산짐승들이 놀랄까 싶어 "야호"를 소리 높여 외치지도 않았다고 한다.
계곡을 끼고 걷다보면 흰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가 경쾌한 리듬으로 귓전을 울린다. 가지를 늘어뜨린 소나무에서 나는 솔향기가 나도 모르게 코를 벌름거리게 만든다. 자연 속에는 노래가 있다. 풀잎과 나무와 새들이 부르는 노래가 널려 있고, 하늘에는 태양과 구름과 바람이 부르는 대자연의 합창이 메아리친다.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하며 천천히 걷다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도시의 세속적인 소음도 견딜 만 해진다.
빈 몸으로 나를 맞아주는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걷다 보면 산은 어느새 돌아누우며 또 다른 풍경을 펼쳐 보이곤 한다. 어느덧 숨이 턱에 차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걸터앉으면 나뭇가지를 쓸고 가는 바람이 눈부신 햇살을 쏟아놓는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봄의 풍광은 사방의 연못에 가득찬 물이요. 여름에는 산봉우리에 걸려 있는 구름이요, 가을에는 밝게 빛나는 달이요. 겨울을 대표하는 경치는 산자락에 서 있는 외로운 소나무"라고 했던가. 겨울 숲에서 유독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소나무다.
소나무가 눈길을 잡아끄는 이유는 모든 나무들이 잎을 내려놓은 겨울 숲에서 홀로 푸른빛을 간직한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소나무가 푸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지가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많은 활엽수들이 잎을 모두 내려놓은 채 빈 가지로 눈을 맞을 때 소나무는 그 푸른 솔잎으로 인해 눈을 이고 섰다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가지가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폭설이 내린 어느 겨울날, 깊은 산중에서 가지가 찢긴 소나무의 비명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 소리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절규처럼 처연하고도 여운이 길었다. 골짜기에, 혹은 산등성이에 조용히 서 있는 소나무의 한결같은 푸른빛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해마다 닥치는 서리와 눈을 뿌리치고 이겨냈기에 비로소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산길을 걷다 보면 간혹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소나무를 보게 된다. 이끼조차 살 수 없던 불모의 바위 위에 소나무가 우뚝 서서 푸른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것은 한겨울에 소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얼려 조금씩 바위에 틈을 내어 설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나무는 스스로의 뿌리를 얼려 틈을 벌리고, 바위는 단단한 자신의 몸에 틈을 만들어 소나무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는 말이 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다. 하지만 우리도 소나무와 바위처럼 서로에게 틈을 내어주며 이 추운 겨울을 건너가야겠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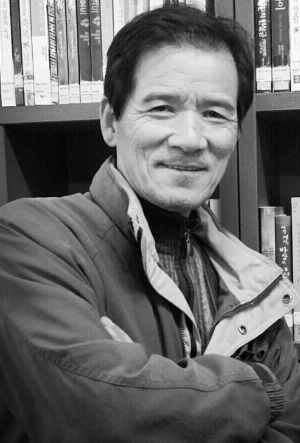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