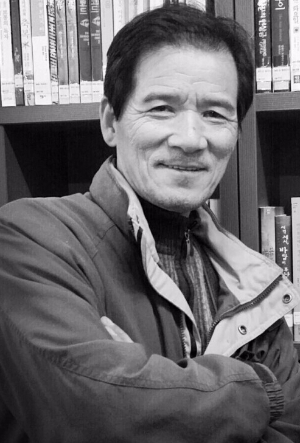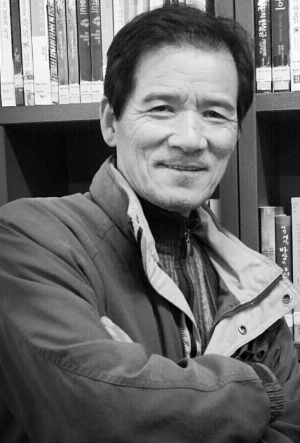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입춘(立春)이 지난 지 엿새나 되었건만 옷깃을 파고드는 새벽 한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해오는 입춘의 풍습 중에 '아홉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근면하고 끈기 있게 살라는 교훈적인 세시풍습으로, 이날 각자의 임무에 따라 아홉 번씩 부지런히 일을 되풀이하면 한 해 동안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글방에 다니는 아이는 천자문을 아홉 번 읽고, 나무꾼은 아홉 짐의 나무를 하고, 노인은 아홉 발의 새끼를 꼬고, 계집아이는 나물 아홉 바구니를, 아낙들은 빨래 아홉 가지를 하는 식으로… 또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이라 하여 입춘 날이나 대보름날 전야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화를 면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사람들은 그저 복을 빌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짓는' 마음을 지니는 법부터 익혔던 것 같습니다.
새해의 첫 절기인 입춘을 지나니 꽃 빛이 간절해지며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烟巒簇簇水溶溶(연만족족수용용) 산봉우리 봉긋봉긋, 물소리 졸졸
曙色初分日欲紅(서색초분일욕홍) 새벽 여명 걷히고 해가 솟아오르네.
溪上待君君不至(계상대군군부지) 강가에서 기다려도 임은 오지 않아
擧鞭先入畵圖中(거편선입화도중) 내 먼저 고삐 잡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네.
이 시는 퇴계 이황이 청량산으로 들어가며 친구인 이문량에게 건넨 시이지요. 봉긋이 솟은 청량산의 계곡으로 들어가며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 옛 선비의 멋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문득 나도 퇴계의 시를 흉내 내어 봄을 일으켜 세운다는 입춘(立春)을, 봄으로 들어간다는 입춘(入春)으로 바꾸어 쓰고 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꽃소식이 들려올 것만 같아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지만, 여전히 수목들은 겨울 빛을 간직한 채 묵언수행 중이고 천지간을 불어가는 바람소리 여전히 사납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의 시린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는 비탈진 산길을 걸으며 봄을 향해 걸었습니다. 겨울날의 찬바람 눈보라를 견디느라 두텁고 딱딱해진 나무들의 수피를 어루만지며 메마른 가지 위로 연둣빛 새 순이 돋아나는 즐거운 상상 속에 잠시 나를 풀어 놓았습니다.
아직 응달 짝엔 잔설이 희끗희끗 남아 있었지만 볕 바른 곳엔 마른 풀 사이로 초록빛이 어룽거렸습니다. 아직은 먼 곳의 손님일 수밖에 없는 봄의 기척을 찾는 일이 조급증을 앓는 마음이 빚어낸 소용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리저리 옮기는 눈길은 한시도 기대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누렇게 마른 한해살이풀을 헤치고 어딘가에 꼭 돋아나 있을 것만 같은 솜털 보송한 여린 싹 하나 만나질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 때문인지 발밑에 강력한 스프링을 달아 놓은 것처럼 옮기는 발걸음이 마냥 가벼웠습니다.
쇠가 단단해지기 위해선 담금질이 필요하듯이 고운 꽃빛을 얻기 위해선 앞으로도 한두 번쯤의 꽃샘추위는 더 견뎌야 할 것입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칼바람 속에서도 마음만은 까닭 없이 점점 느긋해지고 희망이 샘처럼 솟아나는 것은 아마도 봄이 오리란 굳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테지요.
혹한의 북풍이 잠시 걸음을 늦추게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봄은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이란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여유롭게 하고 미운 북풍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겠지요.
비록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푸념 대신 스스로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간 퇴계처럼 나를 일으켜 세워 봄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마음의 빈 곳간에 봄빛을 가득 채우고 그대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온갖 꽃들이 가득한 봄 들판에서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는 날까지 무탈하십시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