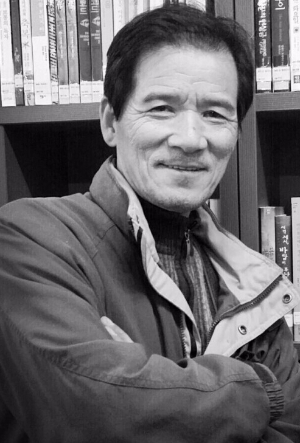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군복무 시절을 빼면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명절 풍경마저 바꾸어 놓은 것이다. 하릴없이 북한산 둘레길을 서성이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답답함과 무료함을 달래었다. 만약에 가까이에 이런 숲마저 없었다면 명절 연휴를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자연은 내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다. 사람들과 만남이 쉽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숲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숨구멍과도 같은 존재라는 게 새삼 드는 생각이다.
연휴 내내 기온이 따뜻하여 곧 봄이 올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남산에 산개구리가 알을 낳았다고 지인이 개구리알을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비록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지만 우무질에 싸인 개구리알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부지런한 지인들이 보내오는 봄소식으로 인해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기엔 미안한 생각이 앞선다. 마음속에 봄을 일으켜 세운다는 입춘도 지났으니 바야흐로 봄을 찾아 나설 때다.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몸소 찾아 나서야 하는 계절이 바로 봄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겨우내 초록에 목말랐던 탓일까. 아직은 옷섶을 헤집는 바람이 차가워도 포장된 도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생동하는 봄의 기운이 느껴진다. 마른 풀 사이로 방사형으로 펼친 잎을 지면에 바짝 붙인 채 겨울을 이겨낸 로제트 식물들의 붉은 빛이 도는 초록 잎만 보아도 반갑다. 양지바른 잔디밭에 청자색의 개불알풀 꽃도 간간이 눈에 띄고 강둑엔 버들강아지가 탐스럽게 피어 있다. 겨울에 쥐불을 놓아 시커멓게 그을린 밭두렁엔 솜털 보송한 쑥들이 제법 자라 있다.
비탈진 산길을 오르다 보니 페트병을 매단 가느다란 호스를 꽂고 있는 고로쇠나무가 눈에 띈다. 필경 고로쇠 수액을 받으려고 꽂아놓은 것일 터였다. 사람들의 부지런함에 혀를 내두르다가 수액을 빼앗기는 나무들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찼다. 봄이 온 것을 온몸으로 알아차리고 땅속으로부터 부지런히 물을 길어 올리던 고로쇠나무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듯 자신들의 수액을 빼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울까? 인간의 역사가 곧 자연 파괴의 역사에 다름 아니지만 어쩌면 고로쇠나무는 이미 훔쳐갈 인간의 몫까지 가늠하여 부지런히 물을 길어 올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로쇠나무가 그렇게 수액을 빼앗기고도 해마다 푸른 그늘을 드리울 수 있겠는가. 자신의 뼈를 튼튼히 해보겠다고 남의 수액을 훔치는 인간에 비하면 고로쇠나무는 차라리 성자에 가깝다.
누군가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온다.’고 했듯이 봄을 찾는 일은 곧 꽃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타고 난 아름다움이 제각각인 꽃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으면서도 옛사람들이 많은 꽃 중에 매화를 제일 앞줄에 놓은 이유도 꽃이 귀한 계절에 눈을 이고 먼저 피어나는 희소가치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눈 속에 피는 설중매가 귀한 대접을 받은 것은 찬 눈 속에도 이미 봄이 들어 있음을 일깨우는 까닭이 아닐까 싶다.
앞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퍼붓는 폭설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치게 마련이고, 살을 에는 혹한의 추위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난(蘭)과 함께 하는 것은 아내와 함께 하는 것과 같고, 국화와 마주하는 것은 벗을 만나는 일과 같고, 매화를 찾는 것은 은일한 삶을 사는 선비를 찾는 일과 같다.”고 했다. 삶이 무료하다면 크게 기지개를 켜고 꽃을 찾아, 봄을 찾아 나서길 강권한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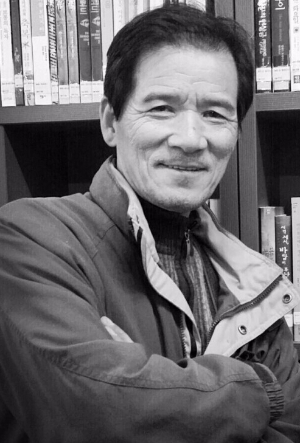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