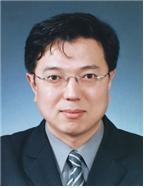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투자자들을 멘붕에 빠트린 미래에셋증권 MTS 장애가 대표사례다.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지 이틀째인 지난달 19일 크게 요동쳤다. 따따상(공모가 두 배 상장 후 이틀째 상한가 진입)을 기대한 주가가 예상과 달리 뒤집어지자 거래량 폭주로 MTS가 접속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래를 못 하는 상황이 약 100분쯤 동안 지속되며 하락하는 주가에도 주식을 팔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렸다.
이런 MTS장애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언제인지도 거의 맞출 수도 있다. 투자자의 관심이 큰 기업공개(IPO) 초대어들이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MTS장애를 예방하는 증권사의 전산투자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58개 증권사의 전산운용비는 지난 2018년 기준 5419억 원, 지난 2019년 5368억 원, 지난해 580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동학개미에 비유되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몰려 거래가 급증해도 전산운용비를 거의 늘리지 않은 것이다.
증권사가 전산운용비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다. 전산투자비용보다 MTS장애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전산장애보상규정을 보면 주인공은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전화녹취나 매매주문(로그)기록이다. 문제는 피해자인 투자자가 전산장애가 일어난 순간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는 장애 사실을 확인할 화면캡처나 전화기록을 남길 생각을 하기 쉽지 않다. 비상주문시 주문폭주에 따른 체결지연은 주문장애에서 제외되며, 매수주문 등에 따른 기회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증권사에게 유리한 보상구조로 증권사 입장에서 큰 돈을 들여 전산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중이다. 금소법에 금융상품판매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금융회사가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산장애에도 입증책임을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에 물으면 어떻게 될까? 전산투자비용보다 입증책임과 관련 인력, 조직구축, 시간 등 비용이 급증한다. 당연히 전산장애예방을 위해 대규모 전산투자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사고, 팔 때 파는 것은 위탁매매업을 하는 증권사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지금이라도 전산장애의 입증책임을 증권사로 바꾸는 규정개정으로 전산장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단독] 삼성웰스토리, 베트남서 5억대 세금추징 ‘망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184&h=118&m=1&simg=2024112312284308390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