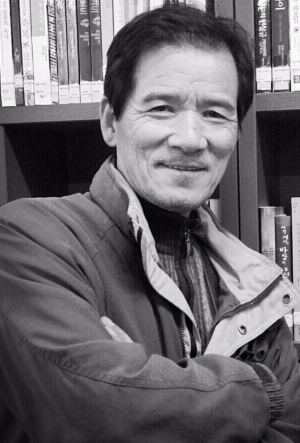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로 인해 익숙했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낯설어졌다. 봄이 와도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했는데 그런 나의 염려를 알아차렸는지 올해는 유독 빨리 꽃이 피었다. 그것도 세상의 꽃들이 경쟁하듯 동시다발로 피어나서 잠시도 어느 한 곳에 눈길을 멈출 수가 없을 지경이다. 바람꽃을 찾아 겨울빛이 채 지워지지 않은 산기슭을 서성일 때만 해도 과연 봄이 올까 싶었는데 예년과 달리 성급하게 찾아온 봄은 코로나로 인해 답답해진 우리를 위로하듯 천지간을 온통 꽃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 사람들은 하나 같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흠칫 놀라 뒷걸음을 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여느 봄과 매한가지로 곱디고운 꽃들을 가득 피워놓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틈틈이 자전거를 타고 천변에 나가 꽃을 본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람결도 한결 부드러워져서 자전거를 타기에도, 그냥 걷기에도 마냥 좋은 시절이다. 백목련이 탐스러워 눈길 주다 보면 어느새 살구꽃이 피어 있고, 흰 앵두꽃이 하롱하롱 지는가 싶으면 초록 이파리 사이로 붉은 명자꽃이 빼꼼히 얼굴을 내민다. 보랏빛 제비꽃이 고와 쪼그려 앉으면 노란 민들레가 눈에 들어오고, 고개를 들면 수양버들 연둣빛 가지 사이로 조팝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꽃이 피는가 싶으면 꽃이 지고, 지는가 싶으면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 그 자리를 메운다. 천변의 복사꽃이 오가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가 싶으면 구청에서 정성 들여 가꾼 꽃밭엔 색색의 튤립이 만개해 있다. 어디를 걸어도 꽃길만 이어지는 요즘이다.
천변 산책로엔 봄을 즐기러 나온 상춘객들로 붐빈다. 저마다 살아온 세월은 다를지라도 화사한 봄꽃들이 풀어놓는 향기로 그윽해진 길을 동행이 되어 함께 걷는 사람들. 무리 지어 피는 들꽃이 더 아름답듯이 우리도 한데 어우러질 때 더욱 향기로워 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사람들 사이를 걷다가 잠시 꽃그늘에 앉아 다리쉼을 하며 무심코 바라본 건너편 산빛이 푸르다.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는 화려한 꽃빛을 잠재우며 연두에서 초록으로 짙어져 오는 산 빛은 색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복사꽃잎 흩어 물 위에 띄우며 초록 불길 번지는 봄 숲을 우두망찰 바라본다. 저 숲을 한나절 걸어 나오면 바짓가랑이에 풀빛 배이듯 내 마음도 신록으로 물들어 푸르러질 것만 같다.
깊은 강일수록 고요히 흐르는 것처럼 대자연은 소리 없이 많은 것을 펼쳐 보여준다. 검은 대지 위에 새싹을 돋게 하고, 마른 풀 사이로 눈부신 꽃을 피게 하고 빈 숲 속에 초록의 기운을 불어 넣는다.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자연이 주는 묵언의 가르침을 알아차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꽃 지는 아침엔 울고 싶다고 한 시인도 있지만 꽃 진 뒤에 점점 푸르러오는 산 빛을 보며 나는 슬픔에 잠기기보다 희망의 시를 쓰고 싶어졌다. 그렇게 쓴 나의 졸시 '신록'이다.
"신록은/ 연두에서 초록으로 건너가는/ 나무들이 온몸으로 쓰는/ 숲의 역사다// 신록(新綠)이라 적고/실록(實錄)으로 읽는"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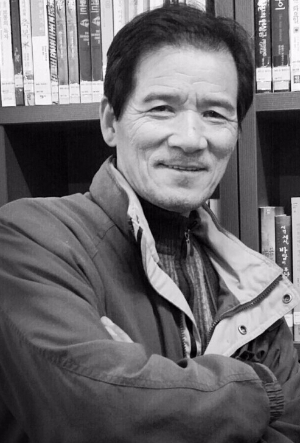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