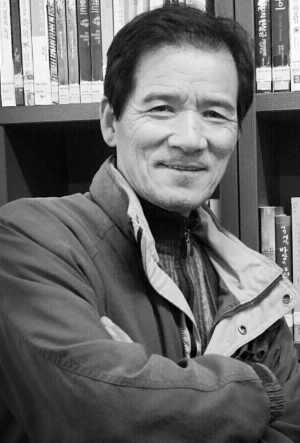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얼마 전에 썼던 꼬리명주나비에 관한 칼럼을 읽은 지인으로부터 쥐방울덩굴 씨앗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생태습지에 쥐방울덩굴을 심어 아이들에게 꼬리명주나비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그 마음이 예뻐서 선뜻 그러마고 했는데 막상 그 씨앗을 구하려니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아직은 씨앗이 여물지 않아 채취하기엔 이르고, 씨앗이 여물기를 기다리기엔 구청에서 천변에 조성해 놓은 쥐방울덩굴 군락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여 틈날 때마다 천변으로 나가 쥐방울덩굴 군락지를 서성이는 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덕분에 귀한 꼬리명주나비 구경은 실컷 하니 그 또한 나쁘지 않다.
어느새 천변 산책로를 따라 심어놓은 산딸나무에 붉은 열매가 탐스럽게 익었다. 허기진 직박구리 한 마리가 그 붉은 열매를 쪼아댄다. 나무 밑엔 산딸기를 닮은 붉은 열매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봄날, 흰나비 떼가 내려앉은 듯 하얗게 꽃을 피우며 천변을 환하게 하더니 이토록 튼실하고도 탐스런 열매까지 맺다니! 대견한 생각마저 든다. 탐스런 열매를 가득 달고 있는 산딸나무 그늘을 벗어나 주변의 나무들을 찬찬히 둘러본다. 저만치에 붉은 열매를 가득 내어달고 다소곳이 가을볕을 쬐고 있는 나무는 산사나무다. 오월에 흰 꽃이 피는 산사나무는 열매가 붉고 사과를 닮아서 '산에서 자라는 사과나무'란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서리가 내린 뒤에 따 먹으면 달고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아직 푸른빛을 간직한 모과와 산수유 열매, 지난해의 열매를 함께 달고 있는 오동나무, 그리고 노랑에서 점점 붉은 기운을 더해가는 마가목의 열매까지 주변의 나무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양의 열매들을 내어달고 있다. 그중에도 가장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열매는 작살나무 열매다. 보랏빛 구슬을 꿰어놓은 듯한 작살나무 열매는 꽃보다 아름답다. 가을 햇살 아래 보석처럼 빛나는 보랏빛 열매를 보고 있으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된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때맞추어 말없이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들을 보면 큰 스승을 만난 듯 고개가 숙여진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특별히 이룬 것도 없이 공연히 수선만 피운 것 같은 내 자신이 자꾸만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풍경을 펼쳐 보여준다. 초록목숨들은 말없는 가운데 자신이 지닌 혼신의 힘을 다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낸다. 사나운 비바람을 묵묵히 견디면서도 마침내 탐스런 열매를 우리 앞에 내어놓는다. 일찍이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이란 시에서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고 했다. 대추 한 알 속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쯤은 들어 있다고 했는데 비단 대추뿐이겠는가. 세상의 모든 열매는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 잘 익은 열매 하나만 마주하고 있어도 자연의 불언지교(不言之敎)에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가을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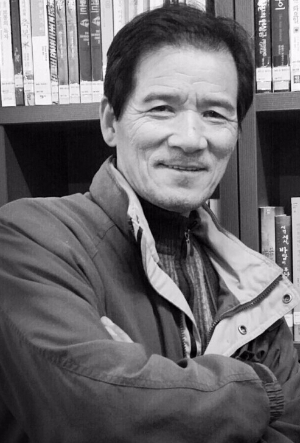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