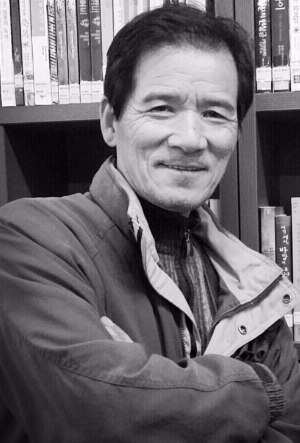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길가의 꽃들이 간밤의 추위 때문인지 한결 소슬해 보인다. 꽃잎들은 추레해졌고, 채 물들지 않은 이파리를 서둘러 바닥으로 내려놓는 나무들도 있다.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아래를 걸을 때면 마른 낙엽들이 밟힌다. 도종환 시인은 ‘단풍 드는 날’이란 시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고 했는데 채 버릴 준비도 하기 전에 들이닥친 것이다. 가을이면 초록의 나뭇잎들은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절정으로 타오른다.
우리는 그 절정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자아내지만 나뭇잎의 그 화려한 성장(盛粧)은 나무들의 겨울 채비의 일환이다. 잎을 다 버려야 최소한의 에너지로 춥고 건조한 겨울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나뭇잎 속에 저장된 영양소를 모두 회수하고 낙엽으로 떨구고 몸속의 수분을 줄인다. 수분은 영양소를 운반하는 필수물질이지만 겨울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몸속의 물을 뺀 나무들은 혹한의 추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포 내 용액의 농도를 높여 얼지 않는 부동액으로 몸을 채운다. 잎을 버리기 위해 잎자루에 떨켜를 만들어 잎에서 만든 영양분의 이동을 막아 단풍이 드는 것인데 채 물들 틈도 주지 않고 한파부터 몰아치니 나무의 입장에선 찬바람이 야속하기도 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보일러에 기름을 채우고 두툼한 방한복을 준비하듯이 식물들은 저마다 오랜 세월 환경에 적응하며 터득한 질긴 생명력으로 겨울 채비를 한다. 가을이 오면 잎이 지지 않은 채로 겨울을 나는 소나무는 겨울이 오면 지방의 함량을 높여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기공 주변에 두꺼운 세포벽과 왁스층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열과 물을 관리한다. 대개의 나무의 겨울눈은 털이나 비늘잎에 싸여 있거나 단단한 껍질이나 송진에 싸여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 겨울눈 속엔 모든 것이 들어 있다. 꽃도 들어 있고, 잎도 들어 있고, 가지도 들어 있다. 겨울눈은 혹한을 견뎌야 하는 고난의 상징인 동시에 새봄을 향한 희망이기도 하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무의 겨울눈은 가을이 오기 전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조금은 소슬해진 나무들의 안색을 살피며 창포원을 걷다가 포천구절초를 만났다. 구절초(九節草)는 야생국화 중 가장 크고 기품 있는 꽃이다. 오월 단오가 되면 마디가 다섯이 되고, 9월 9일이 되면 마디가 아홉(九節)이 되며, 이때 잘라 약으로 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아홉 번 죽었다 다시 피어도 첫 모습 그대로 피어난다.’고 한 어느 시인의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꽃이다. 그중에서도 포천구절초는 내 고향 포천의 한탄강 가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꽃이라서 더욱 정겨운 꽃이기도 하다.
한껏 싸늘해진 기온에도 불구하고 맑고 그윽한 향기로 허공을 채우는 포천구절초를 바라보며 내 안의 향기를 가늠해본다. 갑자기 빙점을 오르내리는 날씨의 변화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기온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나무들처럼,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의 향기를 풀어놓는 구절초처럼 의연하게 가을을 건너가야겠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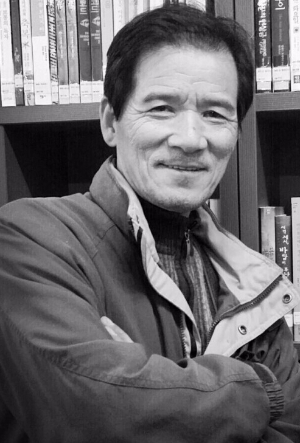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