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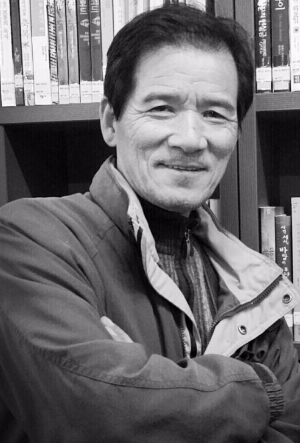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그래도 다행인 것은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입 막고 코 막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연스레 숲과 가까워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숲을 맘껏 즐길 수 있었으니 아이러니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숲에서는 누구나 다 주인공이며 모두가 또한 조력자로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며 존재 그 자체로의 마음껏 빛을 발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숲에 들면 마치 바흐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모나고 거칠었던 생각들이 부드럽고 순해지며, 어느새 부족하고 불편한 것들은 여유로움으로 채워지며 과하여 부담스러운 것들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숲은 늘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모습을 연출한다. 봄은 봄 대로, 가을은 가을 나름의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찬연히 빛난다. 봄날의 바람꽃이나 노루귀꽃, 한 여름날의 나리꽃과 도라지꽃, 가을 들판의 쑥부쟁이나 눈 속에 핀 동백꽃을 떠올려 보라.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 곱디고운 꽃의 색을 명확히 표현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만큼 자연의 색은 종잡을 수도 없고 개념에 가둘 수도 없는 신비로운 색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저녁 무렵 석양을 받은 감나무 가지 끝에 까치밥으로 남겨진 홍시를 보거나 노랗게 익은 모과 열매를 보면 어여쁜 꽃의 기억을 떠올리기보다는 그 나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 열매 하나를 가지 끝에 매달기까지 그네들의 생을 적시고 흔들었을 수많은 비와 바람의 시간들, 그 숱한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 속으로 자신의 열매를 내어 단 그 당당함과 마주하면 세상에 불평만 하며 살아온 내 지난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곤 한다.
이젠 세월이라 불러도 될 만큼 제법 오랜 날을 들꽃들을 보며 살았다. 세상엔 아직도 내가 아는 꽃보다 모르는 꽃이 훨씬 많지만 내가 꽃을 보며 깨달은 것 중의 하나는 '들꽃은 어울릴 때가 더 아름답다.'는 사실이다. 들꽃들을 보면 작은 꽃들이 서로 어울려 하나의 큰 꽃 모양을 이루기도 하고 주변의 다른 꽃들과 어울려 천상의 꽃 들판을 연출하기도 한다. 자기 절제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어울림'의 전제 조건이라면 꽃들은 어울림의 미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들꽃들은 자신을 돋보이려고 허장성세를 하거나 자신의 화려한 색으로 남의 기를 죽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다. 코로나로 인해 송년회 모임도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그동안 타인을 향해 세웠던 날 선 생각들을 모두 거두고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자. 고마웠던 이들에게 당신으로 인해 올해도 참 따뜻했노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그리하면 우리의 어둡던 마음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감싸며 피어나는 흰 눈꽃처럼 눈부시지 않을까?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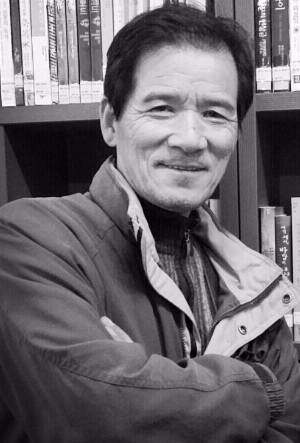


























![[초점] 스텔란티스, 트럼프 고율 관세에 美 자동차 부품공장 5곳...](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415580408238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