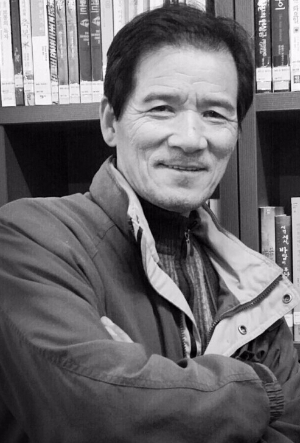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봄이 온다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빼앗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나는 봄을 기다린다.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번지 없는 봄바람처럼 세상이 어수선해도 어김없이 봄은 오고 꽃은 핀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봄은 기다림이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가만히 앉아서 봄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도바람꽃을 찾아 세정사 계곡에 다녀왔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꽃 산행이다. 너도바람꽃은 절분초(節分草)란 이명으로도 불릴 만큼 겨울과 봄의 경계에 피는 꽃이어서 너도바람꽃을 보아야 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딱히 꽃이 아니라도 계곡을 따라 오르며 여기저기 눈길을 놓다 보면 작은 새움이 돋아나는 나무들과 작을 풀꽃들이 눈에 띈다. 볕 바른 둔덕엔 보랏빛 제비꽃과 봄까치꽃, 광대나물꽃, 냉이꽃이 피었다. 물소리 명랑하게 흘러가는 냇가엔 버들강아지 눈을 뜨고 작은 둠벙엔 개구리알도 보인다. 겨우내 칙칙하던 솔빛도 한결 싱그러워졌고 물오른 버들가지에는 연둣빛 안개가 서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 인간은 숲이라는 녹색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건강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는 진화심리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얼음 덮인 세정사 계곡엔 바람꽃을 찾는 사람들로 제법 붐볐다. 너도바람꽃, 꿩의바람꽃, 복수초 등 봄꽃들을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고 하산하는 길에 청띠신선나비를 보았다. 자갈길 한복판에 고요히 나래를 펴고 묵상하듯 앉아 일광욕을 하고 있는 나비의 검은 날개 위에 푸른색 띠가 유난히 아름답다. 나비목 네발나비과에 속하는 청띠신선나비는 꽃보다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다. 낙엽 상에서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청띠신선나비는 날개를 접으면 낙엽과 구분이 안 될 만큼 흡사하지만 날개를 펴면 흑색 바탕에 흰색과 푸른색의 띠가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돋보인다. 주로 참나무류 수액이나 썩은 과일에 잘 모이는 청띠신선나비는 특이하게도 꽃을 탐하지 않는다. 탐화봉접(探花蜂蝶)이라 하여 벌과 나비가 꽃을 탐하는 게 자연의 이치이건만 청띠신선나비는 꽃의 아름다움에도 혹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히 신선이라 칭할 만하다.
'나비'라는 우리말의 어원은 날아다니는 빛, 날빛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누르스름한 색을 띠는 벌레를 뜻하는 듯한 'butterfly'라고 한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근사한가. 영원을 꿈꾸지만 부서지기 쉬운, 우리네 삶의 모습을 닮은 나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듯 사뿐한 날갯짓으로 언덕을 넘어 유유히 사라진다. 현재 지구상엔 모두 9만여 종의 나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나비는 8과 253종으로 이들 나비는 대부분이 구북구계에 속하는 것이고 동양구계에 속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비율은 대략 5:1 정도라고 한다.
누군가는 '산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침묵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 말을 빌려 말하자면 '나비가 아름다운 것은 꽃 속의 꿀을 빨되 그것에 탐닉하지 않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다. 군집 생활을 하는 벌과 비교하여 나비는 백치미를 지녔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내 눈에 비친 나비는 세속의 삶을 초월한 은자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꽃들이 피고 지는 동안 나비들도 생멸을 거듭하겠지만 나비의 날개가 상징하듯 영원을 꿈꾸지만 부서지기 쉬운 우리네 삶, 어느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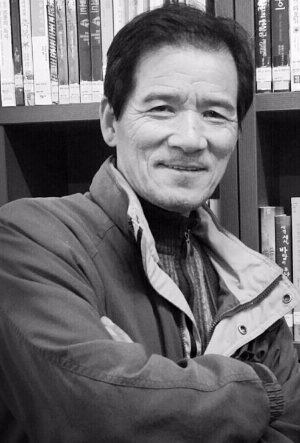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