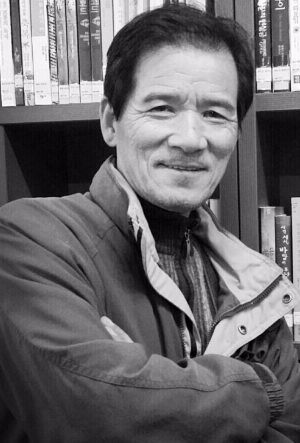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바람꽃을 찾아 얼음 덮인 계곡을 헤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천지간이 온통 꽃빛으로 가득 차서 출렁이고 있다. 일부러 꽃을 찾지 않아도 눈길 닿는 곳마다 터지는 꽃 폭죽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암호를 해독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이 예술가라는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어여쁜 꽃을 보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란 생각마저 든다.
맑은 향기로 발길을 붙잡던 청매, 홍매는 이미 끝물이고 백목련도 한껏 흐드러져서 꽃잎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물소리는 한결 명랑해졌고, 천변의 풀들은 초록으로 싱그럽고 일찍 새순을 틔운 귀룽나무도 햇살을 받아 작은 이파리들이 연둣빛으로 반짝거린다. 볕 바른 잔디밭엔 봄맞이꽃과 꽃마리, 냉이꽃, 제비꽃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봄 햇살을 즐기고 천변 담을 따라 피어난 개나리꽃이 오가는 이들의 얼굴에 노란 봄물을 들이고 있다.
방학천을 산책하다가 어린이집 담장 위로 가지마다 환한 꽃송이를 가득 피워 단 살구나무를 보고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어린 시절 고향 집 뒤란에 있던 늙은 살구나무가 추억처럼 떠올랐다.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고 했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살구꽃을 볼 때면 언제나 고향 친구를 만난 듯 반갑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일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어 살구꽃을 찍고 있는데 내 곁을 지나던 젊은 남녀가 “어머, 벌써 벚꽃이 피었네!”하고 소리쳤다. 살구꽃이라고 말하려다가 괜히 잘 난체하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꽃망울이 벙글어졌을 때 벚꽃과 살구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십중팔구 시골 출신이다. 꽃이 피는 시기도 비슷하고 꽃의 생김새 또한 닮았으니 혼동하는 것도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화르르 타오르듯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과 달리 살구꽃은 산골 처녀처럼 수줍게 피는 꽃이다. 벚꽃보다 열흘쯤 일찍 피었다가 벚꽃이 필 때쯤 꽃잎을 떨구고 자리를 양보한다. 닮은 듯 다른 두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구꽃은 붉은빛이 감도는 분홍색이고 벚꽃은 분홍빛이 섞여 있는 하얀색이다. 또한 살구나무 표피는 벚나무보다 시커먼 편이고, 벚나무의 표면은 매끄러운데 반해 살구나무는 우둘투둘한 편이다.
살구꽃과 벚꽃을 구별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랄 수도 없고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관심의 차이며 관찰의 문제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심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찰은 그 사람의 정신의 깊이와 섬세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단번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키 큰 꽃나무들이 한꺼번에 피워내는 벚꽃이나 목련, 살구꽃도 눈부신 아름다움이지만 냉이꽃이나 꽃다지, 꽃마리 같은 작은 풀꽃에도 탄성을 내지르는 까닭은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어여쁜 꽃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의 탁해진 영혼을 씻어내고 삶의 고단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봄이 주는 축복이 아닐까 싶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살짝 비틀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착한 사람이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꽃을 보는 사람이 착하다’라고. 가로변의 벚나무들이 금세라도 꽃 폭죽을 터뜨릴 양으로 한껏 부풀어 있다. 이제 어딜 가도 꽃이요, 어디서나 봄이다. 하지만 오는 듯 가 버리는 게 봄이요, 찰나에 피고 지는 게 꽃이다. 코로나로 우울한 세상, 부지런히 꽃을 보며 눈도장 찍고 가슴에도 지워지지 않을 예쁜 꽃 도장을 찍는 봄날이기를 소망해 본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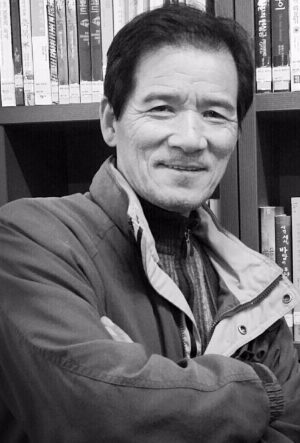




























![[서울모빌리티쇼] 넥쏘·PV5·제네시스 컨버터블 콘셉트 등 눈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40315445608370112616b072175213103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