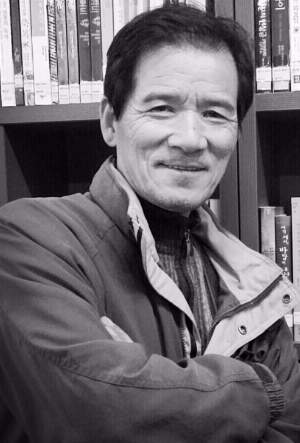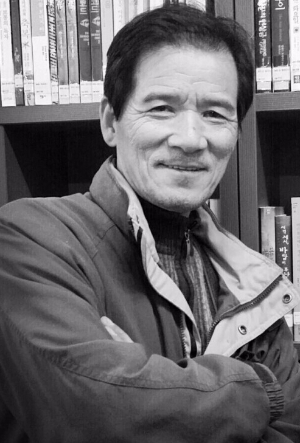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햇빛 투명한 봄날, 이어폰을 꽂고 슈만의 ‘봄날’을 들으며 숲길을 걷는다. 클라라와 사랑에 빠진 슈만을 감동시킨 아이헨도르프의 연작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 리더크라이스(liedrkreis)에 들어 있는 곡 중 하나인데 이 곡을 듣고 있으면 만물의 소생에 환호하는 듯한 벅찬 감동과 함께 첫사랑의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어깨 위로 내려앉는 은빛 햇살을 받으며 봄바람 속을 걸어 숲으로 가는 발걸음은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가볍고 설렌다. 벚꽃엔딩은 봄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밀물 들 듯, 꽃 진 뒤에 조용히 번져가는 연두와 초록의 물결을 보고 있으면 다시 맥박이 요동치고 까닭 모를 희망이 샘 솟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초록 잎 사이로 연분홍 꽃을 달고 선 모과나무를 지나고, 향낭이라도 지닌 듯 바람이 일 때마다 싸목싸목 향기를 풀어놓는 수수꽃다리 곁을 지나 숲 들머리에 이르렀을 때 노란 꽃을 달고 선 꽃나무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 꽃 히어리를 똑 닮아서 눈여겨보았던 꽃인데 선뜻 그 이름이 떠오르질 않았다. 다름 아닌 도사물나무 꽃이다. 도사물나무란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일본명 토좌수목(土佐水木)을 우리 말로 옮기면서 일본어 ‘도사’와 한글 ‘물나무’가 합쳐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히어리와 피는 시기도 비슷하고 꽃의 생김새 또한 흡사하여 선뜻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유일한 방법은 꽃자루와 잎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히어리는 털이 없어 밋밋하지만 도사물나무는 솜털이 솟아 있다.
꽃나무 이름 하나를 아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라고 했던 구상 시인의 말처럼 봄날은 어딜 가도 꽃밭이다. 철 난간에 걸어 놓은 화분 속 팬지꽃도 아름답고, 화단에 곱게 핀 데이지와 돌단풍, 담장을 따라 피어난 황매화도 눈부시다. 길섶에 노란 민들레와 흰 냉이꽃, 봄 하늘빛 닮은 꽃마리도 봄볕 아래 화사하기만 하다. 일부러 눈 감지 않으면 천지간이 온통 꽃밭이요. 걷는 길 어디나 꽃길이다. 그 많은 꽃을 지나쳐 숲에 이르면 활엽수 교목들이 뿜어내는 초록 숲의 향기와 더불어 점점홍으로 수를 놓은 연분홍 철쭉꽃이 반긴다.
나무들은 서로 어울려 숲을 이루고 숲은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일상에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준다. 생명의 기운이 생동하는 봄 숲은 멀리서 바라만 봐도 더없이 좋은 풍경이지만 스스로 숲의 일부가 되어 천천히 숲길을 걸으면 숲의 생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나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계절이 겨울이라면 봄은 나무가 한자리에 붙박인 정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란 걸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다.
‘자연은 위대한 도서관’이라고 한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요즘 같은 봄날엔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숲에서 나무를 바라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숲길을 걷다가 놀고 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보았다. 근처 어린이집에서 숲 체험을 나온 모양이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숲의 고요를 흔들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어 나뭇잎 사이로 햇빛을 뿌려댄다. 숲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표정이 꽃처럼 곱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