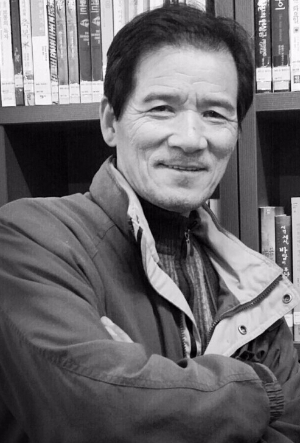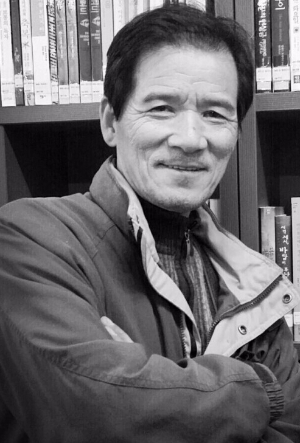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변혁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던진 듯한 이 한 구절은 실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이다. <두 도시 이야기>는 프랑스 대혁명을 시대적 배경으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두 도시를 살아가는 민중의 이야기를 통해 혁명의 이면을 그려낸 역사 소설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 문장을 소환한 것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갈마드는 시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치며 깊은 울림을 주는 명문장이다.
숲의 변화도 사람 사는 세상 못지않다. 정성으로 피워 올린 꽃들을 발치에 내려놓은 꽃나무들이 초록으로 딴청을 피우는 오월도 중심에 가까워지면서 꽃나무들은 저마다 이름들을 버리고 숲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초록으로 너끈히 한세상을 이루며 한층 짙어졌다. '꽃이 져도 너를 잊은 적 없다'는 시인의 맑은 고백을 못 믿는 건 아니나 꽃 진 뒤의 나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나는 늘 나무들에 미안하여 숲 언저리를 서성인다.
어느덧 화려하게 봄을 끝자락을 수놓던 모란꽃이 진 자리엔 육각의 뿔 같은 씨방이 부풀고, 참기름을 발라놓은 듯 햇빛에 번들거리는 담쟁이 잎은 수직의 담벼락을 타고 넘는다. 은빛 햇살은 감나무 잎에서 미끄럼을 타고 초록으로 짙어지는 숲에 바람이라도 일면 아카시아 꽃향기가 안개처럼 밀려든다. 흐르는 시간 앞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젊음도, 사랑도, 우리의 인생도 봄날의 꽃과 같다. 그나마 현명하게 사는 길은 현재의 시간, 바로 지금에 충실히 하는 것뿐이다. 2년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던 코로나도 서서히 끝나가는 듯하다.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꽃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 때나 찾아가도 숲은 기꺼이 나를 받아준다. 늘 같은 듯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라일락 향기 그윽한 성당 모퉁이를 돌아 명자나무 생울타리를 지나 숲 들머리에 닿으면 점점이 피어 있는 애기똥풀꽃이 나를 반겨준다. 햇살에 적당히 데워진 숲 내음이 꽃향기처럼 코를 간질인다. 숲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눈에 띄는 꽃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진달래가 피었는가 싶으면 어느새 철쭉이 피어 있고, 철쭉이 졌는가 하면 때죽나무꽃이 피어나 향기를 풀어 놓고 있다.
부지런히 꽃 이름을 외우던 때가 있었다. 부지런히 야생화를 찾아다니며 하나의 꽃 이름이라도 더 알고 싶어 안달 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까? 한 생각이 이마를 쳤다.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세상에 내가 아는 꽃보다 모르는 꽃이 훨씬 많다는. 그렇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알 수 없듯 꽃 또한 다 알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고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이 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삶에도 향기가 스미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억과는 무관하게 숲은 조용히 변화하며 날마다 초록의 문장을 쓴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울적하다면 오월의 숲에 들어 생생히 살아 있는 신록을 찬찬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초록으로 쓴 숲의 역사. 신록(新祿)은 실록(實錄)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