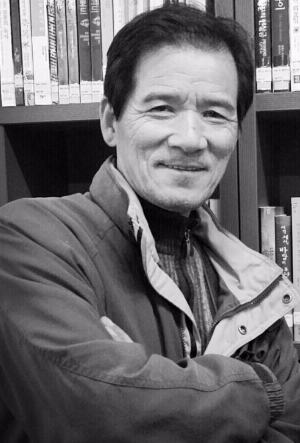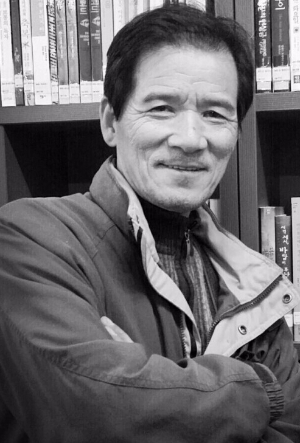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비에 젖은 낙엽이 뜨는 냄새, 선한 나무들이 뿜어내는 지구의 향기, 숲 어딘가에서 새가 울고, 그 소리는 다시 숲을 흔들어 계곡의 물소리가 되살아난다. 풀잎에 맺힌 빗방울을 털어내며 숲길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정화되어 숲과 한 몸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이 일기도 한다. 솔잎마다 빗방울을 구슬처럼 꿰고 있는 솔숲을 걸으면 짙은 소나무 향이 온몸을 휘감아 심신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만 같다.
숲 공부를 할 때 숲에서 비를 만나면 활엽수와 침엽수 중 어느 쪽이 비를 피하기 좋을까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언뜻 생각하기엔 잎이 넓은 활엽수 밑이 비를 피하기 좋을 듯한데 정답은 침엽수다. 솔잎은 가늘어도 잎의 양은 참나무보다 훨씬 많다. 솔잎은 작은 잎이 촘촘히 나 있어 빗방울이 표면장력으로 떨어지지 않아 참나무 같은 활엽수보다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 아래가 비를 피하기에 더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작은 예에 지나지 않을 뿐 숲은 모든 나무가 소중하다. 참나무는 참나무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저마다 소중한 숲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가치를 따지고 분석하고 이해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숲의 변화가 너무도 느리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나무 수업’의 저자 페터 볼레벤은 “나무는 정말 너무너무 느리다. 아동기와 유년기가 우리의 열 배나 되고 전체 수명도 최소 우리의 다섯 배는 된다. 잎이 피고 순이 자라는 등의 적극적 동작들은 한 번에 몇 주나 몇 달씩 걸린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는 나무가 돌처럼 온몸이 굳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라고 썼다. 이런 이유로 숲을 이루는 나무를 보고 그 변화를 단박에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욕심을 접고 숲을 바라보면 숲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생각을 바꾸면 지금까지 알던 숲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숲을 볼 수 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게 ‘사랑’이듯이 숲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감을 열어 느끼는 것이다.
백승훈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