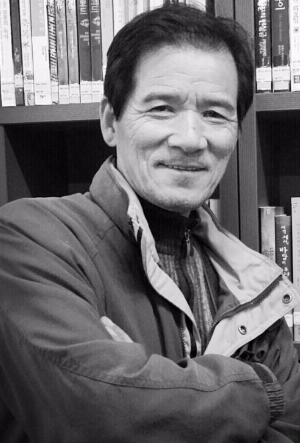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어느 해였던가. 남도의 작은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고 빗소리에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다. 이른 새벽, 마른 목을 축이려고 샘물가를 찾았다가 짙고 강렬한 향기에 아찔해지고 말았다. 치자꽃 향기였다. 샘물가에서 밤새 비를 맞았으련만 여전히 짙은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 향기에 매혹되어 한동안 샘물가를 떠날 수 없었다. 비를 맞고 있는 치자꽃을 보니 아련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그런 의미에서 꽃은 추억을 환기시키는 방아쇠가 되기도 한다.
치자나무는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중국 원산의 상록성 작은키나무이다. 1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는 걸 보면 이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일부러 심지 않으면 절로 자라지 않으니 지금도 이국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꽃이다. 추위에 약한 편이어서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지방에선 밖에서도 잘 자라지만 중부지방에선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해 대개는 분에 심어 집안에 두고 키우며 꽃을 즐긴다. 잎은 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로 긴 타원형으로 표면에 윤기가 있다. 6~7월에 바람개비 모양으로 피는 하얀 꽃은 꽃도 아름다운 데다 좋은 향기가 강하다. 꽃잎이 6~7개로 갈라지고 열매는 여섯 개의 등각이 있고 10월에 등황색으로 익는다. 꽃이 좀 작고 겹꽃으로 피는 것은 꽃치자라고 한다.
요즘엔 대부분 꽃을 보기 위해 이 나무를 키우지만 예전엔 꽃도 좋지만 염료로 쓰이는 열매를 얻기 위해 키웠다. 치자열매는 우리나라 전통 염료 중 대표적인 황색 염료였다. 옷감을 물들이거나 부침개나 떡에 물을 들일 때에도 사용하였다. 꽃도 식용할 수 있고 한방에선 피를 맑게 하고 몸에 열을 내리게 하는 약재로도 쓰일 만큼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나무가 치자나무다.
먹구름이 밀려오는 장마철, 창가에 치자꽃 화분 하나 놓아두면 후텁지근한 무더위라도 맑고 짙은 치자꽃 향기가 천년 침향처럼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어 견딜 만해진다. 어느 여름 날, 그 향기에 매혹되어 썼던 시를 다시 꺼내어 읽어본다.
"뜨락에 자욱한 꽃향기로/ 그대 다녀가신 줄 알겠습니다// 새하얀 꽃잎 노랗게 시들면/ 그대 그리움이 깊은 줄 알겠습니다// 까만 어둠에 밀물지는 풀벌레 소리로/ 그대 못다 한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치자꽃 향기에 그을려 잠 못 드는 밤/ 그대 아직 내 사랑인 줄 알겠습니다 (졸시 '치자꽃 향기' 전문)
이미 제주에선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다. 하늘 가득 밀려오는 먹구름으로 보아 곧 전국이 장마권에 들것 같다. 가뜩이나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힘든 요즘, 궂은 비 내리는 장마철로 접어들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눅눅해져서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치자꽃 화분 하나 창가에 놓아두는 것도 슬기로운 여름나기가 될 것이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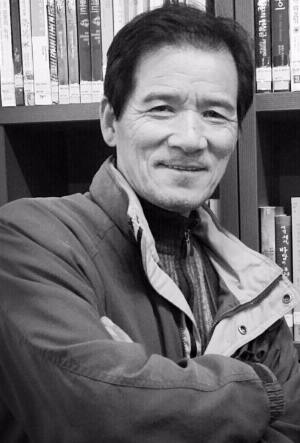
























![[초점] 머스크 vs 오픈AI 법정 공방…美 연방 판사 "일부 소송 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50205072452034199a1f3094311109215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