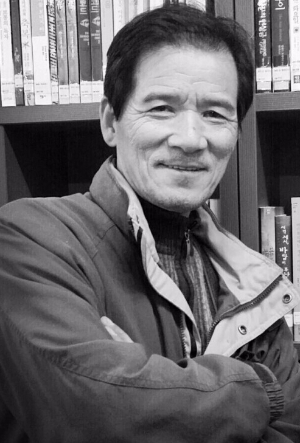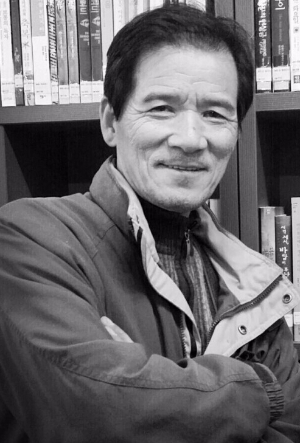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꼬리명주나비를 위해 조성해 놓은 쥐방울덩굴 군락지엔 부들레아 꽃이 피기 시작했고 둑을 따라 심어 놓은 왕원추리꽃도 꽃대를 밀어 올려 하나 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흰색의 나무수국도 피고 천변의 해바라기밭에도 노란 꽃빛이 물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폭우에 쫓겨 집안에 들어앉은 사이 꽃들은 피어나고, 무더위에 지쳐 그늘로 숨어드는 동안에도 나무들은 쉬지 않고 가지를 뻗고 잎을 펼쳐 그늘의 평수를 늘려왔던 게다.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으면서 고운 모습만 탐하는 게 염치없는 일이긴 해도 그냥 지나치는 무심함보다는 낫지 싶기도 하다.
꽃밭 사이를 누비며 피어난 꽃들을 완상하다가 천변에 나앉아 모래톱의 새들을 본다. 새들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망원경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 새들은 항시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 하면 여지없이 다가선 만큼 달아난다. 청둥오리와 왜가리, 쇠백로와 중대백로 등 제법 많은 새들이 눈에 띈다. 새들을 보다가 문득 어느 신경정신과 의사의 말이 생각났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새들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새들에겐 날개가 있기 때문이란다. 새나 사람이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을라치면 훌쩍 다른 곳으로 날아가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몸에 탈이 나서 병원을 오가다 보니 일순 날개를 지녀 스트레스를 모르는 새들이 부러운 생각이 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학천에서 해오라기를 만났다. 사냥을 하는 중인지 토사가 밀려들어 얕아진 천변에 발을 담그고 수면을 노려보다가 나의 인기척을 느끼곤 몇 걸음 물러섰다. 백로과에 속하는 해오라기는 야행성이라 ‘밤물까마귀’라는 별명도 지녔는데 이 아침에 나온 걸 보면 몹시 허기진 모양이다. 해오라기는 진한 회색의 날개와 흰 배, 머리에서 뒷목 부분은 검다. 흰색의 긴 장식깃이 멋스러운 새다. 해오라기 있는 강이나 하천엔 물고기가 많아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해오라기의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천렵 장소를 고르기도 했다.
해오라기를 보면 부록처럼 따라오는 꽃이 하나 있으니 다름 아닌 해오라기난초다. 난초과에 속하는 해오라기난초는 꽃의 생김새가 해오라기가 나는 모습과 흡사하여 얻어진 이름이다. 해오라기난초는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뜨거워지는 7월에 불볕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순백의 꽃을 피운다. 키는 15cm~40cm 정도인데 줄기 끝에 1~3개씩 달리는 꽃송이는 새가 나는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어떤 연유로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꽃말이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꽃 모양을 보고 있으면 새가 되어 자유로이 날고 싶은 해오라기난초의 바람이 꽃말 속에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짜증이 난다면 짬을 내어 천변에 나가 새들을 관찰하거나 꽃을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 아닐까 싶다.
백승훈 사색의향기 문학기행 회장(시인)